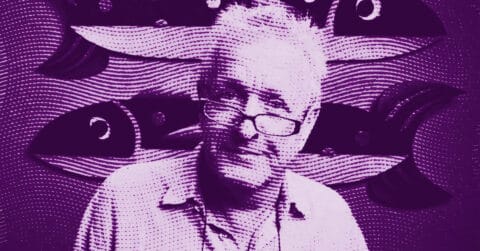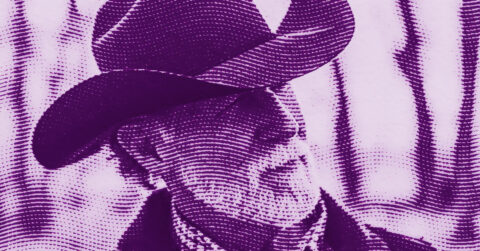잘 들어봐요, 스놉 여러분, 스스로 전문가라고 자처하며 예술을 내려다보는 여러분. 아마도 오른쪽 강변의 무균실 같은 갤러리에서 미지근한 샴페인을 홀짝이고 있겠지만, 도시 전체를 자신의 캔버스로 삼은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다. 퓨처라(Futura), 미래의 약속처럼 울려 퍼지는 이 이름은 단순한 예술가가 아니라 현대 미술의 하늘을 가로지른 유성과 같아 우리가 계속 해독하는 추상색채와 우주적 형상들의 꼬리를 남겼다.
1955년 맨해튼에서 태어난 레너드 힐튼 맥거(Leonard Hilton McGurr)는 뉴욕의 지하 깊숙한 곳에서 경력을 시작해 지하철 객차를 일시적인 우주선으로 바꾸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라, 그의 예술은 어린애 장난이 아니다. 1980년의 그의 대표작 “Break”는 그래피티의 관습을 문자 그대로 부순 폭발적인 색채로, 당시 언더그라운드 씬을 지배했던 미적 정통성에 대한 조용한 선언, 독립 선언문이었다.
퓨처라를 동시대인과 구분 짓는 것은 바로 추상으로의 양자 도약, 도시적 알파벳을 초월해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려는 의지다. 그의 회화들은 갤러리로 옮겨진 벽이 아니라 대체 차원으로의 포털, 원자가 춤추고 행성들이 우주 발레에서 충돌하는 평행 우주의 별 지도이다.
퓨처라는 두 개의 매혹적인 개념적 세계, 천문학과 실존주의의 경계에서 활동한다. 그의 작품들은 마치 천체물리학자 칼 세이건(Carl Sagan)의 “우리는 모두 별의 먼지로 이루어져 있다” [1]는 이론을 떠올리게 한다. “Colorforms”(1991)이나 “Invasion From Blue City”(1989) 같은 그의 작품을 보면 먼 별들이 태어나는 성운, 초신성 폭발이 우주에 우리 존재에 필요한 화학 원소를 퍼뜨리는 광경이 생각날 수밖에 없다. 그의 작품에서 반복되는 원자 모티브는 단순한 그래픽 장식이 아니라 우주와의 깊은 연결의 상징이다.
사강은 “사과 파이를 만들려면 먼저 우주를 창조해야 한다”고 썼다 [2]. 퓨처라는 이 진리, 즉 우주적 진리를 모두가 깨닫기 전에 이미 이해한 듯, 에어로솔 페인트 하나만을 도구로 무(無)에서부터 우주 전체를 화폭에 창조해냈다. 에어로솔 캔을 거꾸로 사용하는 그의 기법, 즉 그의 정밀한 선들을 외과적 정확도로 조절하는 기교는 마치 아원자 입자들을 조작하는 과학자의 솜씨를 떠올리게 한다.
그의 추상적 구도들, 다양한 색안개들이 성간가스 구름처럼 펼쳐지는 모습은 허블 망원경이 촬영한 이미지들을 연상시키며, 우주의 광대함 앞에서 우리의 하잘것없음을 깨닫게 하는 숨 막히게 아름다운 천체 경관들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이 깨달음의 무게에 눌리는 대신, 퓨처라는 화가는 이 거대한 전체에 속해 있음을 축하하며 우리의 우주 탐험가로서의 본성을 껴안으라고 권한다.
이 천문학적 차원은 깊은 실존적 사유와 겹쳐진다. 특히 그의 유명한 “Pointman”을 비롯하여 그의 화폭을 채우는 외계인형상의 인물들은 장폴 사르트르의 타자성 및 정체성에 관한 철학적 사유에서 직접 나온 듯하다. 사르트르가 『존재와 무』에서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고 쓴 바 있듯 [3], 퓨처라는 화가는 초기부터 기존의 예술 흐름에서 벗어나 자신의 예술적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어냈다.
“Pointman”은 길게 뻗은 팔다리를 가진 안드로이드 실루엣으로, 퓨처의 시그니처가 되었으며 이 실존적 탐구를 완벽히 구현한다. 완전히 인간도, 전적으로 외계인도 아닌 이 존재는 기술 시대에 우리가 지닌 중간계에 서 있으며, 유기체와 기계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는 그 공간에 자리한다. 그는 미래의 인간, 즉 퓨터라 화가 본인으로서, 미리 정해진 의미 없는 우주에서 자신의 절대적 자유에 대한 불안과 마주한다.
퓨터가 “El Diablo”(1985)를 그릴 때, 그는 단순히 악마적 인물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사르트르적 “구역질”을 시각화했다. 이는 존재의 급진적 우연성 앞에서 느끼는 현기증 같은 감각이다. 마치 자연스럽게 튀어 오르는 듯 보이는 물감 튀김들은, 본질적 자유와 동반하는 무거운 책임을 자각하는 순간들의 회화적 등가물이 된다.
퓨터의 예술은 이 우주적 결정론과 실존적 자유 사이의 긴장감에 깊게 물들어 있다. 한편으로 그의 원자적 무늬는 우리가 우주 내 다른 물질들과 동일한 물리 법칙에 지배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다른 한편 그의 예측 불가능한 붓놀림들, 즉 “행복한 사고”들은 이러한 제약 안에서도 창조적 자유가 존재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퓨터의 궤적에서 특히 인상적인 점은 예술계가 고집하는 인위적 구분들을 그가 어떻게 초월했는지이다. 거리 예술과 미술관 미술, 상업 예술과 “순수” 예술이 여전히 대립하던 시대에, 그는 이 세계들 사이를 놀라울 정도로 유연히 오가며 예술가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단순한 정의에 자신을 가두지 않았다.
나이키, 꼼데가르송, BMW 같은 브랜드와의 협업은 타협이 아니라 그의 예술 활동의 논리적 확장이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고급 예술”과 “저급 예술” 간의 자의적 구분을 거부하는 것이다. 사르트르가 강조했듯 “인간은 자신이 만드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4], 퓨터라는 화가는 갤러리 아티스트, 디자이너, 기업가, 문화 아이콘을 동시에 자처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무한한 가능성의 다양성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이 국경을 초월하는 능력은 예술계가 아직도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던 시기에 그의 경력 초기에 이미 나타났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1981년 The Clash 콘서트 중 라이브로 그림을 그리던 그의 퍼포먼스는, 밴드가 연주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작품을 창조하는 것이었으며, 음악, 회화, 퍼포먼스가 융합된 획기적인 예술의 성격을 당당히 선언한 것이었고, 21세기의 하이브리드 예술 실천들을 예고한 것이다.
푸투라의 작품 앞에서 우리는 칼 세이건이 ‘우주적인 전율’이라고 묘사했던, 우주의 광대함과 그 안에서 우리의 미미한 위치에 대한 아찔한 감각을 경험한다[5]. 그의 그림들은 미지에 대한 창문이자 공간적이면서 내면적인 탐험에 초대하는 것이다. 아마도 그가 가진 예술의 천재성은 바로 이 능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를 우주의 끝과 인간 조건의 깊숙한 곳으로 동시에 여행하게 만드는 능력.
사르트르적 실존주의는 우리가 “자유에 처형당했다”고 가르친다, 사전 의미 없는 세계에 던져져 우리 스스로 존재의 의미를 발명해야 한다[6]. 푸투라는 이 형벌을 축하로 바꾸었고, 실존적 불안을 창조적 환희로 전환했다. 그의 색채의 폭발들은 반달리즘 행위가 아니라, 생명력을 선언하는 행위이며, 무관심한 우주 안에서 의미를 창조하는 우리의 능력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다.
푸투라의 여정은 또한 회복력의 교훈이다. 1980년대 말 스트리트 아트에 대한 관심이 줄었을 때, 그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택시 운전사나 자전거 배달원으로 일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리고 불사조처럼 재기하여 예술 무대에 화려하게 돌아와, 예술가의 가치는 즉각적인 미디어 가시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을 견지하는 능력에 의해 측정된다는 것을 증명했다.
역경에 맞서 다시 일어나는 이 능력은 사르트르의 진정성 개념을 반영한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살고, 외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유를 온전히 수용하는 것[7]. 푸투라는 예술가가 되기로 선택했고,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로 남았으며, 시장의 불확실함이나 유행의 변화에 의해 정의되기를 거부했다.
분류에 집착하는 시대에 푸투라는 파악 불가능하다. 그는 스트리트 아티스트인가? 추상 화가인가? 상업 디자이너인가? 시각 철학자인가? 그는 이 모두를 동시에 그리고 그 이상을 아우른다. 이 정체성의 유동성은 깊이 사르트르적이다: 인간은 고정된 본질이 아니라 과정이며, 끊임없는 되어감이다[8]. 푸투라는 계속해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재창조하며, 자신의 예술의 역동적 본성을 배반할 고정된 정체성에 머무르기를 거부한다.
그의 작품 “Garbage Rock” (1983)은 유동적인 형태와 공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곳에서 떠다니는 듯한 생동감 있는 색채로 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세계에 대한 비전을 완벽하게 나타낸다. 안정된 본질도, 최종 형태도 없으며, 단지 임시적인 에너지와 물질의 구성일 뿐이다. 이것은 현대 천체 물리학이 묘사하는 우주와 정확히 일치한다. 칼 세이건이 “우리는 우주가 자기를 알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말했을 때도 같은 의미였다[9]. 푸투라는 그의 예술을 통해 이 우주적 자각에 동참하고 있다.
이 예술가에 대해 특히 마음에 드는 점은 끊임없이 새로운 영역을 탐구하면서도 시각적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작품들은 즉시 알아볼 수 있는데, 그 색깔있는 안개, 떠다니는 원자, 외계인 형태의 인물들이 매번 독특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는 반복과 혁신, 개인적 서명과 지속적인 실험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찾았습니다.
뉴욕 지하철 객차에 남긴 초기 그래피티부터 최근의 명품 브랜드와의 협업에 이르기까지, Futura는 결코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지할 수 없는 진정성, 매체나 맥락이 바뀌어도 자신의 비전에 충실함은 그를 단순한 유행 아티스트 이상의 존재로 만들었으며, 현대 미술 풍경에서 진정한 등대이자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Futura의 작품을 마주할 때, 진심으로 멈춰 서서 감상해 보세요. 단순히 화려한 색채의 조합이나 부유한 힙스터들의 장식품으로만 보지 말고, 오히려 우주 공간과 인간 조건의 복잡한 미로를 여행하는 초대장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는 칼 세이건처럼 “우리는 모두 별의 먼지로 이루어졌다”[10]고 이해했고, 사르트르처럼 이 별 먼지가 자유를 운명 지었다고 보았습니다[11].
끊임없이 확장하는 우주, 사전 설정된 매뉴얼 없는 존재 안에서, Futura는 우리에게 창조하고 상상하며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상기시켜 줍니다. 결국 이것이야말로 예술이 담당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역할이지 않을까요?
- 칼 세이건, 『코스모스: 개인 여행』, 제13화, 랜덤 하우스, 1980.
- 칼 세이건, 『코스모스』, 랜덤 하우스, 1980.
- 장 폴 사르트르, 『존재와 무』, 갈리마르, 1943.
- 장 폴 사르트르,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갈리마르, 1946.
- 칼 세이건, 『코스모스』, 랜덤 하우스, 1980.
- 장 폴 사르트르,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갈리마르, 1946.
- 장 폴 사르트르, 『존재와 무』, 갈리마르, 1943.
- 장 폴 사르트르,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갈리마르, 1946.
- 칼 세이건, 『코스모스』, 랜덤 하우스, 1980.
- 칼 세이건, 『우주적 연결』, 더블데이, 1973.
- 장 폴 사르트르,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갈리마르, 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