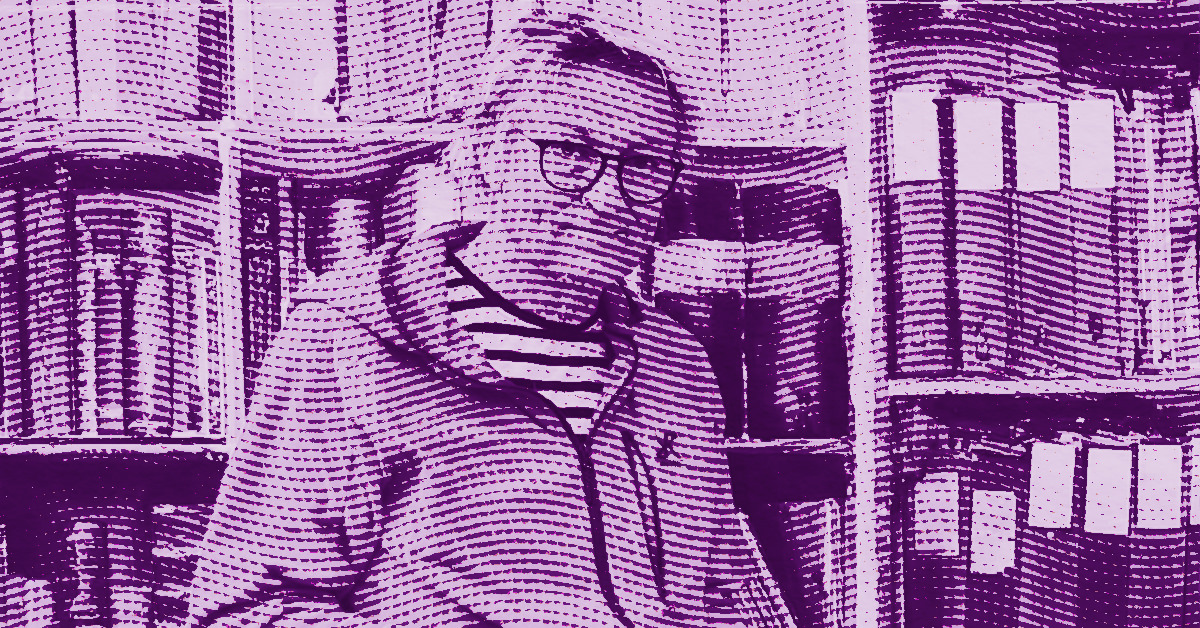잘 들어봐요, 스놉 여러분 : 만약 여러분이 수채화가 향수를 지닌 은퇴자들의 일요일 취미에 불과하다고 여긴다면, 라르스 레린의 450센티미터에 달하는 통제된 혼돈을 결코 감상해 본 적이 없다는 뜻이다. 1954년 뭉크포르스 숲에서 태어난 이 스웨덴인은 물을 그리는 게 아니라, 타르코프스키가 말했듯 시간을 조각한다. 이 비유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스칸디나비아 미술계에서 라르스 레린은 성급한 분류를 거부하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1980년부터 1984년까지 예테보리의 발란 드 미술학교와 겔레스보리 학교에서 수학한 그는, 세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수채화가 중 한 명으로 자리 잡았으며 북유럽 경계를 훨씬 넘어 유럽과 미국의 영혼에 닿았다. 2012년에 개관한 칼스타드의 그의 상설 미술관인 Sandgrund은 이러한 제도적 인정을 보여주지만, 그의 거대한 작품과 직접 대면할 때 진정한 천재성이 드러난다.
라르스 레린은 수채화 예술에 조용한 혁명을 이룬다. 부드러움을 기대하는 곳에 그는 시적인 잔혹함을 강요한다. 그의 작품 크기는 자주 3미터를 넘으며, 전통적인 매체의 친밀함을 몰입형 경험으로 바꾼다. “나는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것을 그린다”고 그는 [1] 말하는데, 이는 우리의 환상에서 벗어난 시대에 그가 재해석하는 터너의 교훈을 떠올리게 한다.
타르코프스키의 시간성 혹은 순간을 조각하는 예술
라르스 레린 작품에는 즉시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감독의 영화적 세계를 떠올리게 하는 시간적 특질이 존재한다. 이 유사성은 우연이 아니며, 그것은 자연의 광활함 앞에서 인간 존재의 형이상학적 탐구로서 예술에 접근하는 공통점을 드러낸다.
타르코프스키는 봉인된 시간에서 순수한 시간의 예술로서 영화를 이론화했으며, 에이젠슈타인의 몽타주와 다르게 실제 지속시간을 포착하는 능력을 강조했다. 라르스 레린의 수채화도 유사한 접근법을 따른다 : 순간을 고정하지 않고, 그 안에 창작 과정의 기억을 담고 있는데, 이 “젖은 위에 젖은” [2] 기법은 물과 안료가 그들만의 물리법칙에 따라 상호작용하게 한다.
특별한 시간성은 그가 12년 간 머문 노르웨이 로포텐 제도의 시리즈에서 드러난다. 헨닝스베르이나 로포텐의 모티프 작품들은 관광지로서의 아름다움보다 존재론적 우울을 포착한다. 타르코프스키처럼 어둠은 빛의 부재가 아니라 더 깊은 진리의 계시이다. 피오르 (2015)에서는 갈매기가 어두운 물 위를 낮게 날고, 몇몇 건물들이 해안에 밀집해 있는데, 이는 “침투하는 어둠의 엄호 아래” [3] 있다. 작품 전반을 가로지르는 손글씨는 관객을 사색적 질문 상태에 머무르게 하는 타르코프스키의 거리두기 효과를 창출한다.
타르코프스키의 영향은 건축물 처리 방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레린의 고립된 집들, “집 근처에 주차된 캐러밴”이나 “로포텐의 차고”는 러시아 거장의 폐허가 된 건물들을 연상시키며, 항상 자연에 의해 재정복될 듯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건축적 취약성은 “북극 겨울의 어둠에 둘러싸인 환경 속 존재 조건”[3]을 표현하는데, 이는 타르코프스키 필모그래피의 중심 주제로, 인간이 우주적 무한성 앞에서 영원히 의미를 추구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린이 타르코프스키와 가장 깊게 연결되는 부분은 아마도 기억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그의 작품들은 시각적 및 텍스트적 기억의 축적으로 작동하며, “아마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삶과 온기의 인상을 포착한 기억의 순간들”[4]을 창조합니다. 이 향수는 자족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식의 도구가 되어, 단순한 자연주의적 재현을 넘어선 시적 진리에 접근하는 수단이 됩니다.
레린은 “순간의 고고학”이라 부를 수 있는 방식을 실천합니다. 그의 여행 노트는 외부 지리학이 내면 풍경을 드러내는 시각적 묵상으로 변모합니다. 이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이중 탐구는 “다양한 검정, 오커, 프랑스 울트라마린”[5]이 드문 세련된 색채 교향곡을 구성하는 그의 대형 작품들에서 꽃을 피웁니다. 예술가는 복제를 추구하지 않고 드러냄을 목표로 하며, “핑퐁 탁자 위에서”[5] 이 거대한 포맷들을 작업하여 작업실을 시간 실험의 실험실로 바꿉니다.
익숙한 것의 불안한 기이함
라스 레린의 작품은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명명한 das Unheimliche, 불쾌한 섬뜩함 속에서 그 특별한 깊이를 찾습니다. 1919년에 발전된 이 정신분석적 개념은 친숙한 것이 갑자기 숨겨진, 비밀스러운, 잠재적으로 위협적인 차원을 드러낼 때 생기는 불안한 감각을 의미합니다.
레린에게 이 불쾌한 섬뜩함은 여러 차원에서 작용합니다. 우선 일상 사물의 묘사에서: 그의 “도자기와 유리 공예” 정물화들은 가정용기구들을 수수께끼 같은 존재로 변모시킵니다. 그가 그린 의자들은 큐레이터 베라 노르달에 따르면 “초상화”가 되어 “스타일, 마모, 의자들 간의 거리 및 방향성 배치에 나타난 개인적이고 관계적인 특성”을 드러냅니다[6]. 이 비어 있는 좌석들은 부재하는 점유자의 유령 같은 자국을 지니며, 프로이트의 unheimlich 특유의 존재와 부재 사이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더욱 불안한 것은, 그가 예테보리 자연사 박물관의 디오라마 작업에서 보여주는 바로 그 불쾌한 섬뜩함의 본질입니다. 그가 “진열장 안에서” 그리고 “사진가 뒤쪽 배경이 유리에 반사된 채” 그리는 “박제 동물들”[6]은 다중 존재론적 층위를 가진 세계를 창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박제된 동물인가요? 그의 회화적 재현인가요? 진열장에 비친 생명 세계의 반사인가요? 이 현기증 나는 층위화는 프로이트가 분석한 자동 인형과 밀랍 인형, 즉 생명과 무생명 사이 경계를 흐리는 대상들을 직접 연상시킵니다.
라스 레린의 불쾌한 섬뜩함은 그가 그린 인적이 끊긴 건축물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표현됩니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시골에 고립된 그의 집들은 결코 단순히 그림 같은 풍경이 아니며, 버려짐과 소멸이라는 잠재된 위협을 품고 있습니다. “항상 존재하는 자연의 요소에 취약한” 이 건물들은 프로이트가 억압의 귀환으로 식별한, 여기서는 우리의 세계 내 존재의 근본적 불안정성을 환기시킵니다.
그의 구성에 얽힌 손글씨는 이 불안한 낯섦에 또 다른 차원을 더합니다. 종종 읽을 수 없는 이 텍스트 단편들은 무의식이 대표 체계에 침입하는 것처럼 작용합니다. 이들은 예술가가 주장하는 “다른 차원, 일기와 편지에 연관된” [7]을 만들어내지만, 동시에 관객에게 완전히 해독할 수 없는 메시지와 마주하게 하여 인지적 긴장을 유발합니다.
이 불확실성의 미학은 Lerin이 정신적 사진과 순수 창작을 혼합하는 작품들에서 정점에 이릅니다. 그는 “직접 인상에서 더 복잡한 작품들”까지 작업하며 일정 시간 후 “더 신선한 시각을 위해 다시 시작” [7]하는데, 이로써 지각적 기준을 혼란스럽게 하는 중간시점을 설정합니다. 그의 풍경은 완전히 기억도, 관찰도 아니며, 프로이트가 unheimlich의 특권 영역으로 식별한 중간 공간을 차지합니다.
덧없는 것의 연금술
Lerin의 기법은 역설적인 숙련도를 드러냅니다: 통제 불가능한 것을 통제하기. 예술가는 “종이 전체에 물을 분사하고 초기 몇 분 동안 직관적인 색감의 워시 안료를 사용해 이 대기적 품질을 얻는” [8] “습식 위에 습식” 방식을 통해 창조적 우연과 지속적인 대화를 만듭니다. 이러한 예기치 않은 발생 수용은 터너에서 추상 표현주의자들에 이르는 미학 전통에 속하지만, Lerin은 자신만의 북유럽적 감성을 더합니다.
그의 색채 접근은 통제와 이완 사이의 균형 추구를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 검정, 오커, 프랑스 울트라마린” [5]을 선호하며, 광채보다는 땅과 그림자에 조화를 이룹니다. 의도적으로 제한된 팔레트는 효과를 절약할수록 더욱 강한 감정적 강도를 만들어냅니다. 그의 회색은 “깊고 어두우며, 또는 천상적이고 빛나며, 마법처럼 내부에서 이미지를 밝혀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9]로서 단색의 표현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드러냅니다.
이 색채 절약은 더 큰 미학적 프로젝트를 돕습니다: 일상에서 비범함을 드러내는 것. Lerin은 엽서 풍경이 아닌 인간 존재의 근본적 고독과 마주하는 “존재 조건”을 그립니다. 그의 야행자들은 “우리를 향해 깊은 눈 속을 걷고, 하늘 위 오로라가 반짝이는 거리를 따라” [3] 나아가지만, “이 모든 아름다움은 야행자의 등 뒤에 있으며, 그는 그것을 보거나 감상하지 못하고 차가움 속에 자신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 우울함은 Lerin에게 절대 나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카타르시스적 기능을 수용하는 예술적 명석함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림을 그리고 이미지(그리고 단어)로 작업하는 것은 내 삶을 다루는 방법이며, 일종의 일상 명상, 루틴” [7]. 예술은 이렇게 정신 생존 도구, 존재적 불안을 관조적 아름다움으로 변형하는 수단이 됩니다.
이 변형은 특히 그의 대형 작업 크기로 이루어집니다. 그의 “206 x 461 센티미터” 작품들은 효과를 노리지 않고 완전한 몰입을 추구합니다. 이 작품들은 관객을 포위하는 시각적 환경을 만들어 육체적이면서도 미학적 경험을 강요합니다. 이 육체화된 미적 수용 차원은 Lerin의 예술이 단지 지성뿐 아니라 인간 존재의 총체적 감성에 호소함을 상기시킵니다.
부재의 시학
라스 레린의 미학 중심에는 결핍과 상실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이 울려 퍼집니다. 이러한 관심은 그의 초기 베름란드 탐구부터 2016년 스웨덴 텔레비전에서 다룬 최근 로포텐 군도 재방문에 이르기까지 그의 전체 작품을 관통합니다.
결핍은 먼저 그의 무인 건축물에서 드러납니다. 이 집들, 차고들, 생선 창고들은 표현 순간에는 결코 사람이 거주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흔적, 즉 마모, 고색, 그리고 시설물들을 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비어 있습니다. 이 공허함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장소에 대한 우리의 관계, 뿌리 내림, 자연의 무관심에 맞서는 인간 사물의 영속성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결핍은 그의 가정용 물건 묘사에서 특히 절절히 드러납니다. 그의 빈 의자들은 음영 초상화처럼 작용하여 오로지 배치만으로도 그것들을 만든 인간 관계를 환기합니다. 무생물을 말하게 만드는 이 능력은 희귀한 시적 감수성을 드러내며, 미세한 흔적 속에서 인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레린은 시간성 처리에서 가장 정교한 결핍의 시학을 전개합니다. 그의 풍경은 절대 현재 순간을 포착하지 않고 항상 지나간 혹은 정지된 시간을 담습니다. 이 유령 같은 시간성은 그의 기법 자체, 즉 수채화가 물의 증발을 포착하여 소멸 과정을 미적 사건으로 전환하는 데서 표현됩니다.
이 덧없음의 미학은 그의 가장 최근 작품에서 완성되며, 예술가는 “먼 나라들뿐만 아니라 베름란드의 골목 구석”[10]도 탐색합니다. 이 확장된 지리적 범위는 그의 시학을 희석시키지 않고 보편화합니다: 어디에서나 인간은 동일한 실존적 질문, 흘러가는 시간과 부서지는 확신에 대한 동일한 불안을 마주합니다.
라스 레린의 작품은 이렇게 현대 인간 조건에 대한 지속적인 사색으로 구성됩니다. 점점 더 도시화되고 비물질화되는 세상 속에서 그는 자연과 시간에 대한 감각적이고 영적인 관계를 생생히 유지합니다. 그의 수채화는 급변하는 시대 흐름 속 고요한 사색의 오아시스처럼 작용하며, 예술이 시간을 늦추고 현실과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고유한 힘을 보유하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특별한 것을 통해 보편적을 감동시키는 이 능력이 레린의 스칸디나비아와 그 너머에서의 큰 성공을 설명합니다. 그의 전시회는 관람객을 끌어 모으며 그들은 그의 풍경에서 잊히거나 억압된 자신들의 일부를 발견합니다. 분명한 기술적 기량을 넘어서, 레린은 세계의 우울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희귀한 선물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바로 그것의 연약함에 대한 자각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대작 앞에서 관객은 “북유럽 숭고”라 부를 수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는 미적 고양과 스칸디나비아 감수성 특징인 존재론적 불안이 뒤섞인 상태입니다. 아름다움과 불안이 불가분하게 섞인 이 양가감성 미학은 라스 레린을 우리 시대 가장 진정한 예술가 중 하나로 위치시킵니다. 그는 쉽사리 위안을 주길 거부하고 인간 존재의 궁극적 질문에 직접 맞섭니다.
그의 영향력은 이제 수채화 애호가의 좁은 범위를 훨씬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스톡홀름 왕립 미술 아카데미에 의해 인정받고, 2014년 아우구스트 상을 그의 책 Naturlära로 수상했으며, 2016년 스웨덴에서 올해의 텔레비전 인물로 선정된 레린은 미학적 타협 없는 대중적 예술가의 희귀한 인물상을 구현합니다. 그는 동시에 문화 엘리트와 대중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능력으로 그의 예술적 진정성을 입증합니다.
하지만 이 성공이 그의 미학적 프로젝트의 근본적인 혁신성을 가려서는 안 된다. 노르딕 수채화를 재창조하며, Lerin은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개념미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그는 창작의 감각적 근원으로의 회귀를 주장하는데, 이 “일상의 명상” [7] 은 작업실을 존재론적이면서도 미학적인 실험실로 만든다.
이 독특한 현대 미술 풍경 속 위치 덕분에 그는 공식 미술에서 자주 간과되는 감정적 영역을 탐구할 수 있다. 그의 작품은 연민 없이 고독을, 방종 없이 우울을, 절망 없이 불안을 이야기한다. 그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존재론적 향수” [4] 를 드러내는데, 이 향수는 우리의 기술 문명이 억압하거나 의학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Lars Lerin의 예술은 이렇게 우리에게 예술의 본질적 기능이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인간 조건을 탐구하는 것임을 상기시킨다. 현대 세계의 가속화 속에서 그의 수채화는 능동적 관조와 광대한 세계 앞에서 우리의 공동 취약성을 묵묵히 인식하는 대안적 시간을 제안한다.
이 미학적 지혜의 교훈은 Lars Lerin을 우리 시대의 필수 창조자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한다. 그는 유럽 예술의 인문주의 전통을 현재의 감수성에 맞게 유지하는 동시에 적응시키는 이들이다. 그의 작품은 고대 노르딕 인간의 염려와 후기 현대의 보편적 질문 사이의 다리가 되어, 각 개인이 진정한 예술이 담고 있는 영원의 일부를 관조의 시간 동안 되찾을 수 있도록 한다.
- Konstantin Sterkhov, “Lars Lerin Interview”, Art of Watercolor, 2012
- Hanna August-Stohr, “The Watercolor Worlds of Lars Lerin”, American Swedish Institute, Minneapolis, 2016
- Galleri Lofoten, “A new approach to Lofoten, Lars Lerin”, 2025
- Bera Nordal, Nordic Water Colour Museum, “Watercolour technique is a powerful tool”, 2011
- Konstantin Sterkhov, “Lars Lerin Museum Interview”, Art of Watercolor, 2013
- Susan Kanway, “Lars Lerin at American Swedish Institute”, Art As I See It Blog, 2016
- Konstantin Sterkhov, “Lars Lerin Interview”, Art of Watercolor, 2012
- Hanna August-Stohr, “The Watercolor Worlds of Lars Lerin”, American Swedish Institute, Minneapolis, 2016
- Galleri Lofoten, “Lars Lerin Exhibition Description”, Gallery Lofoten, 2025
- Sune Nordgren, “As Fast as The Eye”, The Royal Academy of Fine Arts, Stockholm,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