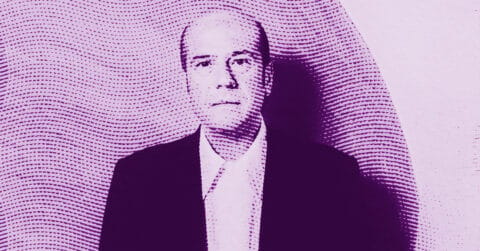잘 들어봐요, 스놉 여러분, 로널드 벤투라는 깔끔한 상자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작가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1973년에 태어난 그 나라처럼 겹겹이 쌓인 층과 다양한 영향, 그리고 불꽃처럼 타오르는 모순들이 폭발적으로 뒤섞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그가 견디기 힘든 빛남을 지니고 있는 이유입니다.
벤투라의 작품을 볼 때마다 저는 여러 문명이 겹쳐 있는 유적지를 발굴하는 아마추어 고고학자가 된 기분입니다. 붓터치는 각기 다른 문화사의 새로운 층을 드러냅니다. 하이퍼리얼리즘, 그래피티, 일본 만화, 가톨릭 상징, 팝요소들이 소음 가득한 옆집 이웃처럼 한 캔버스 안에서 공존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은 조화롭게 작동합니다.
“Grayground”(2011), 소더비 홍콩에서 110만 달러에 팔린 이 작품을 예로 들어보세요. 처음 보면 단순한 아이들의 놀이처럼 보일 수 있는, 마스크를 쓴 인물이 탄 스타일화된 말일 뿐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말의 몸에 새겨진 해부학적 문신이 근육과 장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치 데미안 허스트가 차고에 두고 잊은 수의학 해부학 판넬처럼 말이 됩니다. 이 동물은 필리핀 그 자체를 은유하며, 그 내장이 드러나 해부되었지만 식민 지배자들의 무게 아래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나라를 상징합니다.
내부와 외부, 겉모습과 본질 사이의 끊임없는 이 경계는 롤랑 바르트가 세미올로지에서 말한 “신화” 개념과 비슷합니다[1]. 바르트에게 이미지는 결코 순수하지 않으며, 다양한 수준의 문화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벤투라의 작품도 마찬가지로 복잡한 기호 체계로서, 각각의 시각적 요소는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의미의 네트워크를 가리킵니다.
벤투라가 “Party Animals”(2017)에서 그리는 현대 신화는 반쯤 환각적인 정글 속에서 반려동물, 야생 동물들, 악마 같은 존재들이 불안한 동물 군집을 이루고 있음을 탐구합니다. 가운데 소년은 작가가 어린 시절을 그린 자화상일 수도 있는데, 이 동물 카니발에 놀라면서도 경탄하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르트가 말한 “문화의 자연화”[2]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즉, 신화가 역사를 자연으로, 명백하고 당연한 것으로 변환하는 능력 말입니다.
벤투라 작품에 겹겹이 쌓인 층들은 하이퍼리얼리즘, 그래피티, 팝 문화 참조 등으로 의미의 여러 층위가 서로 침투하고 오염된 것으로 읽힙니다. 바르트에 따르면 “신화는 아무것도 감추지 않는다: 그 기능은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하는 것이다”[3]. 마찬가지로 벤투라는 필리핀의 복잡한 문화를 숨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과장하고 왜곡해서 그 부조리를 온전히 드러내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스페인, 미국, 그리고 잠시 일본에 의해 연속적으로 식민지화된 필리핀은 마치 제빵사가 LSD에 취해 만든 밀푀유처럼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문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벤투라는 이 정체성 분열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거의 변태적인 기쁨으로 그것을 포용합니다. 그의 시리즈 “Zoomanities”(2008)에서 인간의 몸은 미노타우로스가 전 세계 프랜차이즈를 설립하기로 결심한 듯 동물의 머리를 달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형상들은 피할 수 없이 데이비드 크로넨버그의 영화 세계와 그의 “뉴 플레시” [4] 개념을 떠올리게 합니다. 캐나다 감독 크로넨버그는 “비디오드롬”이나 “더 플라이” 같은 영화들을 통해 기술과 미디어의 영향 아래 인간 신체가 급격히 변형되는 아이디어를 탐구했습니다. 크로넨버그와 벤투라에게 신체는 결코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다양한 문화적, 기술적, 생물학적 세력이 충돌하는 전쟁터이자 논쟁의 장입니다.
벤투라의 작품 “E.R. (Endless Resurrection)”(2014)은 크로넨버그 세계관과의 이 친연성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이 비디오 설치 작품에서 예술가는 필리핀의 성주간에 행해지는 자기 채찍질 의식을 기록하는데, 참회자들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는 장면입니다. 이 고통받는 신체들은 고의적으로 고통의 광경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스페인 식민자들이 가져온 가톨릭 신앙의 깊은 영향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벤투라는 이 의식을 촬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카라바조의 “그리스도의 채찍질” 복제품과 대화로 연결시켜 유럽 바로크와 필리핀 현대 종교 관행 사이에 아찔한 시간적 다리를 만듭니다.
이러한 병치는 벤투라의 접근법을 특징짓는데, 그는 문화적 영향들을 위계화하지 않고 동일 공간에서 공존하게 하여 크로넨버그가 말하는 “위반의 영역”을 창출합니다. 이 영역에서는 신성함과 세속, 전통과 현대, 지역과 세계의 경계가 투과성 있게 됩니다. 벤투라는 “나는 이미지의 원초적 의미에서 내 정신을 해방시키고 다른 요소들과 융합하여 상호작용하게 하면서 창조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며 “그것이 이미지의 최초 의미를 배반하며 새로운 의미를 창출한다” [5]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고의적인 원의미 배반은 신체 변형을 진화 또는 오히려 퇴화 형태로 보는 크로넨버그적 비전을 반향합니다. “Cross Turismo”(2014)에서 벤투라는 십자가에 매여 몸을 웅크린 남자를 카니발 이미지, 그래피티, 만화 캐릭터들로 둘러싸인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전통적 종교적 아이콘이 본래 맥락에서 비틀리고 전유되어 새로운 유형의 신성한 신체, 즉 변화하는 영성을 증언하는 포스트모던 하이브리드가 됩니다.
이 접근법에는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주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마치 벤투라가 우리를 문화 해부 장면에 직접 초대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능력이 그의 힘이기도 합니다. 매끄럽고 무해한 예술 작품이 넘치는 세상에서 벤투라는 여전히 의식의 윤곽 아래를 긁어내며 필리핀 집단 무의식의 피로 물든 내장을 드러내는 이미지를 용감하게 제안합니다.
그의 개인적인 동물 백과사전에서 동물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문신을 한 불독부터 벗겨진 말, 그리고 “Hunter” (2015)의 혼합 생물에 이르기까지, 이 동물 형상들은 우리 모두 안에 잠재된 야수성을 탐구하는 도구 역할을 한다. 크로넨버그의 변종 생물들처럼, 이들은 매혹적이면서도 혐오스럽고,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두려움을 구현하는 동시에 새로운 존재 가능성을 열어준다.
“La Nouvelle Chair : 현대 문화에서의 성과 공포”에서 학자 자비에르 멘딕은 크로넨버그 영화에서 “몸은 반란의 장소이자 다양한 문화적 불안이 기록되는 텍스트가 된다”고 분석한다[6]. 이 관찰은 벤투라의 작품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데, 그곳에서 인간의 몸은 종종 변형되고 변태되거나 혼합되어 현대 필리핀 사회를 관통하는 모든 긴장의 수용체가 된다.
벤투라의 예술은 크로넨버그의 영화처럼 우리 자신의 물질성과 신체적·정체성 경계의 연약함과 맞서게 한다. 그것은 우리가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세계 인식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 자체를 형성하는 복잡한 문화적 영향망에 속해 있음을 상기시킨다. 이런 실존에 대한 예리한 자각은 주리아 크리스테바의 혐오와 신체 경계에 관한 분석과 공명한다. 그녀는 “혐오는 청결이나 건강의 부재가 아니라 정체성, 체계, 질서를 교란하는 것, 경계와 위치, 규칙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썼다[7].
벤투라의 작품은 바로 정체성과 체계의 혼란을 키워 나간다. 그의 혼합형 캐릭터들은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흐리며, 극사실주의와 만화, 고전 미술과 그래피티가 공존하는 그의 작품은 전통적인 미학의 위계를 무너뜨린다. 회화, 조각, 설치, 비디오가 융합된 그의 작업 방식 자체가 하나의 고정된 범주에 갇히기를 거부한다.
“Recyclables” (2012)는 싱가포르 타일러 프린트 연구소에서의 레지던시 때 제작한 시리즈다. 벤투라는 여기서 전 세계적으로 위험 경고로 인식되는 주황색 삼각형 교통 표지판을 역이용한다. 그 중 하나에는 해골 머리를 한 만화 캐릭터가 쓰레기 더미 위에 겹쳐져 있고, 다른 하나에는 가스 마스크 너머로 두려움에 찬 눈이 바라보고 있다. 이 이미지는 임박한 환경적 종말을 암시하면서 대중문화와 도시 표지판의 시각 코드를 활용한다.
이와 같이 기존의 기호를 차용하고 전유하는 능력은 바르트의 “신화론”에서 일상 이미지, 광고, 보도 사진, 소비재가 사회·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분석한 접근법을 연상시킨다[8]. 벤투라는 디즈니 캐릭터부터 종교적 상징에 이르기까지 주변 환경을 가득 채우는 시각 아이콘들을 탈취하고 전복하여 그 내재된 의미를 드러낸다.
그의 작품 “Paradise”(2020)는 팬데믹 기간 동안 제작되었으며 이 접근법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366 x 244 cm 크기의 이 대형 캔버스에는 흑백 폭포가 배경으로 사용되었고, 동물 의인화 캐릭터부터 고통스러운 미키 마우스 버전까지 기이한 인물들이 모여 있습니다. “PARADISE”라는 단어가 축제의 글씨체로 작품을 가로지르지만, 모호한 색상들은 기쁨과 행복을 단호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작가 자신이 설명하듯이, 이 작품은 “사람들이 어디서나 축제를 가져오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항상 긍정적이지 않은 이야기들과 인생의 장들에 눌려 있는 방식을 반영합니다”[9].
축하와 절망, 매혹과 혐오 사이의 이 긴장감은 Ventura 미학의 핵심입니다. 이는 Cronenberg가 “육체의 황홀”이라고 불렀던 것과 맞닿아 있는데, 이는 육체 변형이 고통스럽거나 무섭더라도 동반하는 이상한 기쁨입니다. “파리”에서 거대한 곤충으로 변신하는 Seth Brundle 캐릭터는 “나는 인간이 되기를 꿈꾸며 그걸 좋아했던 곤충이다. 하지만 이제 꿈은 끝났고 곤충은 깨어났다”고 외칩니다[10]. 이러한 우리 근본적인 동물성에 대한 비극적인 자각은 Ventura의 작품에도 드러납니다.
필리핀 Ifugao 지역의 쌀 신들의 의례적 형상에서 영감을 받은 “Bulul”(2014) 시리즈 조각들에서 Ventura는 인간성과 동물성 사이의 경계를 탐구합니다. 그는 이러한 전통 조각들을 현대적인 해부학적, 문신을 한, 입체파적이며 천사와 악마의 하이브리드로 변형하여 자신이 “jazz up your Bulul”이라고 부르는 것을 창조합니다. 전통적인 신성한 형상들을 현대 문화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이 작업은 Cronenberg가 “Crash”에서 현대성의 상징적 트라우마인 자동차 사고를 새로운 에로틱 의식으로 바꾼 방식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Cronenberg가 그의 탐구를 가장 극단적이고 불편한 결말까지 밀어붙이는 반면, Ventura는 언제나 도발과 접근성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의 작품들은 종종 불편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기교와 형태미를 유지하여 비전문 관객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갑니다. 이것이 아시아 현대미술 시장에서 그의 놀라운 상업적 성공을 설명하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개념적 급진성과 미적 매혹 사이의 이 긴장은 Ventura를 오늘날 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만듭니다. 이 시대는 금기가 즉시 흡수되고 그것이 비판하려는 체제에 의해 상품화되는 시대입니다. 그의 작품은 우리에게 모순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글로벌 문화화에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현대미술의 국제적 회로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열려 있으나, 분명한 것은 Ventura가 쉽게 분류할 수 없는 작품들을 생산을 계속한다는 점입니다. 문화적 및 신체적 정체성의 경계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를 통해 그는 필리핀 현대 사회의 만화경적인 비전을 제공합니다. 필리핀은 전통과 세계적 영향력, 식민지 과거와 미래의 열망 사이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의 예술은 Barthes가 ‘signifiance’라고 부른 것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의미들이 번식하며 결코 완전히 고정될 수 없는 과정을 말합니다[11]. Ventura의 작품들은 열린 텍스트로서, 다양한 의미층과 문화적, 역사적 층들이 겹치고 충돌하는 시각적 증언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로널드 벤투라의 그림 앞에 설 때는 단순히 그의 기술적인 기교나 미술 시장에서의 가격만을 감상하지 마세요. 그의 다층적인 면에 빠져들고, 그 모순과 애매함 속에서 헤매 보세요. 바로 이런 범주 사이의 불안정한 공간, 경계가 흐릿해지는 이 금기 영역에서 그의 작품의 진정한 힘이 자리잡고 있으니까요.
- Barthes, Roland. “Mythologies”, Éditions du Seuil, 1957.
- 동일 서지.
- 동일 서지.
- Cronenberg, David. Interview dans “Cronenberg on Cronenberg”, Faber & Faber, 1992.
- Ventura, Ronald. Cité dans “Ronald Ventura. An Introspective” par Angelo Andriuolo pour Juliet Art Magazine, 2022년 4월 9일.
- Mendik, Xavier. “The New Flesh: Sexuality and Horror in Contemporary Culture”,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8.
- Kristeva, Julia. “Pouvoirs de l’horreur. Essai sur l’abjection”, Éditions du Seuil, 1980.
- Barthes, Roland. “Mythologies”, Éditions du Seuil, 1957.
- Ventura, Ronald. Cité dans “Ronald Ventura. An Introspective” par Angelo Andriuolo pour Juliet Art Magazine, 2022년 4월 9일.
- Cronenberg, David. “La Mouche”, 20th Century Fox, 1986.
- Barthes, Roland. “Le Plaisir du texte”, Éditions du Seuil, 1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