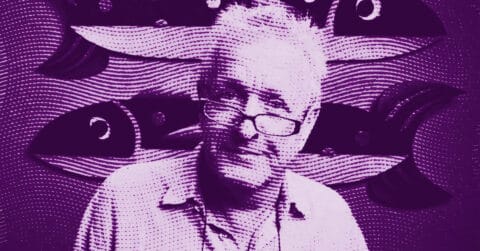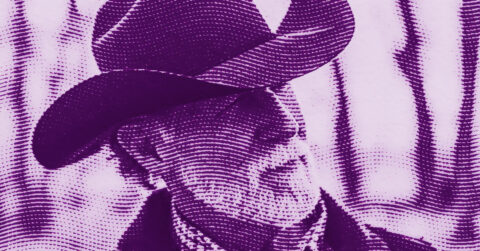잘 들어봐요, 스놉 여러분, 이런 얌전한 척하는 현대 미술가들 정말 지긋지긋해요. 아드리아나 바레장은 여러분의 따가워질 뺨에 오래도록 남을 시각적 뺨때림을 선사해요. 1964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태어난 이 브라질 출신 여성은 얇은 점잔음 대신 내장들이 튀어나온 깨어진 아줄레주 타일을 선호한다.
바레장은 흔한 욕실을 정치적 선언장으로 바꿀 수 있는 몇 안 되는 예술가 중 하나다. 그녀의 매끄럽고 갈라진 표면은 상처를 현대적 광택으로 가린 국가의 피부와 같다. 그녀가 “Ruines de Charque”라는 건축 구조물을 전시할 때마다,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내장들은 브라질 식민지 과거의 무게가 우리에게 떨어지는 듯하다. 이 작품들은 네 세기 억압된 역사의 폭력으로 폭발하는 인류학적 시한폭탄과 같다.
바레장의 미학은 의도적으로 양가적이며, 매혹과 혐오 사이를 흔든다. 그녀는 관객을 임상적으로 아름다운 타일 공간에 빠지게 한 후 그 공간을 갈라 내부의 혼돈을 드러낸다. 이 방법은 미셸 푸코가 권력 도구로서의 건축에 대해 논한 생각을 강하게 떠올리게 한다. 프랑스 철학자가 설명했듯이: “공간은 모든 권력 행사에서 근본적이다”[1]. 그녀의 단색 “사우나”와 “목욕탕”에서는, 바레장이 이러한 신체가 동시에 통제되고 해방되는 규율적 공간들을 해체하여 식민지 지배자들에게서 물려받은 표현 체계의 허점을 드러낸다.
바레장이 집착적으로 사용하는 포르투갈산 세라믹 타일인 아줄레주에는 우연이 없다. 이 아줄레주는 아랍, 중국, 유럽, 아프리카 등 다양한 영향의 흔적을 담은 문화적 증언이다. 파란색과 흰색 타일은 강제적 혼합, 즉 사전 크리올화를 이야기한다. 바레장이 타일을 차용, 왜곡, 피 흘리게 할 때 그녀는 식민 유산을 비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화하고 변형하며, 1928년 오스발드 지 안드라지의 유명한 “만화경 선언”에 이론화된 문화적 식인 풍습을 완벽히 구현한다.
이러한 문화적 소화 과정은 자크 데리다와 그의 해체 이론을 떠올리게 한다. “문법학에 대하여”에서 데리다는 “텍스트 밖에는 아무 것도 없다”[2]고 쓰며, 맥락이나 의미 네트워크 밖에는 존재가 없음을 시사한다. 바레장의 작품들은 정확히 이 원칙에 따라 작동한다: 식민지 미술에 쌓인 의미의 층을 드러내고 조각내며, 새롭고 전복적인 논리에 맞게 재조립한다.
“폴보” 시리즈는 이 문제에 관한 그녀의 가장 강렬한 작업일 것이다. 1976년 인구조사에서 브라질 사람들이 피부톤을 묘사할 때 사용한 용어에서 영감을 얻은 자신만의 피부색 팔레트를 창조하여, 그녀는 인종 분류의 부조리함을 드러내면서도 그 지속적인 힘을 인정한다. “브랑키냐”(눈처럼 흰색)에서 “모레나웅”(큰 흑인)까지, 거의 동일한 이 자화상들은 우리의 인종 인식이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자의적이지만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함을 보여준다.
바레장(Varejão)의 접근 방식은 편안한 위치에서 식민주의를 비판하는 유럽 예술가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녀는 자신이 비판하는 시스템 바깥에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이 복잡한 역사에 자신의 참여를 인정하며 의도적으로 그 중심에 위치합니다. 미술사학자 조첸 폴츠(Jochen Volz)가 강조하듯, “그녀는 자신의 이미지를 사용하지만, 이 작품들 중 어느 것도 자화상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술가는 자신이 이 과거에 관여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3].
바레장의 작품은 깊이 있는 에로틱함을 지니고 있으며, 저속하거나 무분별한 의미가 아니라 고기와 초월을 항상 연결하는 바로크 전통에 속합니다. 그녀의 에로티시즘은 조르주 바타유(Georges Bataille)의 것으로, “에로티시즘은 죽음까지 삶에 대한 승인”이라고 합니다 [4]. 삶과 죽음, 쾌락과 고통, 아름다움과 공포 사이의 긴장은 그녀의 작업 전반에 걸쳐 지속됩니다. 그녀의 “언어와 절개”와 “육포의 폐허”는 욕망과 폭력, 말과 침묵의 자리로서 살점을 드러냅니다.
바레장이 단순히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아줄레조(azulejos)를 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녀의 작업은 훨씬 더 복잡하고 정치적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인용이나 차용을 하지 않고, 오히려 쿠바 비평가 세베로 사르두이(Severo Sarduy)가 “대체(substitution)”라고 부른 바로크 고유의 방법을 실천합니다. 이것은 원래 의미를 이동시켜 새로운 의미를 확립하는 방식입니다 [5]. 그녀가 명백히 무해해 보이는 식민지 장면에 벌어진 상처를 삽입할 때, 단지 이미지를 전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내재된 폭력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녀 작품의 가장 매혹적인 측면은 아마도 시간과 노는 능력일 것입니다. 11세기 송(宋) 왕조 도자기에서 영감을 받은 그녀의 균열들은 역사적 시간이라기보다 지질학적 시간을 환기시킵니다. 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가 신세계(New World)의 도시들에 대해 “모든 것이 건설 중이면서도 이미 폐허인 것처럼 보인다”고 쓴 것처럼 [6], 바레장의 작품은 도달하지 못한 미래와 진정으로 극복되지 않은 과거 사이에 매달린 이 역설적인 시간성을 완벽히 포착합니다.
이 시간성과 지리 사이를 끊임없이 넘나들며, 바레장은 마르티니크 작가 에두아르 글리상(Édouard Glissant)이 부른 “관계성의 시학(poétique de la Relation)”을 창조합니다. 이는 단일 뿌리에 반대되는 리좀(rhizome)적 사유입니다. 글리상은 “단일 뿌리는 주변을 죽이는 반면, 리좀은 다른 뿌리와 만나기 위해 뻗어나가는 뿌리”라고 썼습니다 [7]. 바레장의 예술은 바로 이 리좀으로, 다양한 문화, 시대, 위도의 얽힌 지도입니다.
그녀가 이미지에 접근하는 방식에는 깊은 영화적 요소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원근법의 단색 사우나는 스탠리 큐브릭(Stanley Kubrick)의 미로 같은 공간을 떠올리게 합니다(“샤이닝(The Shining)”을 생각하세요, 그녀의 작품 중 하나가 “O Iluminado”라는 제목인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나 큐브릭과 달리 바레장은 소외감을 조성하려 하지 않고, 식민주의 역사로 인해 분열된 세상에서 연결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주로 그녀의 멕시코 탈라베라(Talavera)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들에 나타나는 기하학적 무늬 조작은 문화 간 형식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관한 정교한 이해를 드러냅니다. 이 무늬들을 분리하고 확대함으로써, 그녀는 기하학적 추상이 백인 서구 사유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프리콜럼비아 미술에서부터 원주민 몸 장식, 브라질리아의 아토스 불커앙(Athos Bulcão)의 아줄레조, 루벰 발렌팀(Rubem Valentim)의 신성한 무늬까지, “감각적 기하학”에는 수많은 뿌리와 목적지가 존재합니다 [8].
그녀가 단순한 도자기 타일을 이데올로기적 전장으로 바꾸는 능력에 어떻게 감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중립적으로 보이는 이 표면들은 그녀의 붓 아래서 세계에 대한 다양한 관념들이 치열하게 싸우는 장소가 됩니다. “Proposta para uma Catequese”에서 그녀는 문자 그대로 교리교육의 스크립트를 뒤집어, 수동적으로 영체를 받는 대신 토착민들이 그리스도를 먹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호세 레자마 리마가 말한 바와 같이, 이 바로크식 “역정복” 행위는 그녀의 접근법의 전형입니다.
최근에는, 2021년 뉴욕의 가고시안에서 전시된 “Talavera” 시리즈에서 Varejão는 이 과정을 더욱 깊이 탐구하며, 스페인 기술과 토착 기술이 혼합된 멕시코 자기 전통을 탐색합니다. 큐레이터 루이사 두아르테가 설명하듯, “여기서 단순히 기하학적, 이상적, 명료하며 조직적인 것과 신체의 생명 영역에 가까운 예측 불가능한 뿌리조직의 흔적을 병치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기원을, 그리고 왜 안 되겠냐만, 기하학적 추상의 또 다른 운명을 사유하는 것입니다”[9].
Varejão의 작업은 예술이 결코 순수하지 않고, 결코 단순히 미학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예술은 항상 권력 체계, 지배와 저항의 역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무익한 비난 태도에 갇히기보다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인식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하는 복잡하고 미묘한 시각을 제시합니다.
분명히 이것이 오늘날 그녀의 작업이 매우 관련성이 높은 이유일 것입니다. 정체성의 위축과 차이에 대한 거부를 주장하는 반동적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나타나는 시대에 그녀의 예술은 우리의 정체성이 이미 혼혈적이며, 이미 타자와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녀의 작품은 단지 식민지 과거에 대한 비판일 뿐만 아니라 탈식민적 미래에 대한 제안이기도 합니다.
일부가 문화적 순수성, 유사성에 기반한 상상된 공동체 개념에 필사적으로 매달릴 때, Varejão는 교차, 혼합, 만남의 생산성을 주장합니다. 그녀의 차이의 시학은 궁극적으로 가장 급진적인 정치 행위이며, 지금까지 지배해온 인간중심적이고, 남성중심적이며, 자기중심적인 포괄적 담론과는 구별되는 다른 인식론을 상상하도록 초대합니다.
수십 년 동안 동일한 주제를 끊임없이 탐구하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움을 창조하는 작품의 일관성에 어떻게 매료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1980년대 초기 바로크 양식의 회화부터 오늘날의 거대한 설치 작품에 이르기까지, Varejão는 독특하고 즉각 인지할 수 있으면서도 예측 불가능한 시각 언어를 구축해왔습니다.
서구 예술 기관들이 그녀의 작업을 전 지구 남반구에서 온 이국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정체성, 역사, 권력에 관한 현대 논의에 대한 중요한 기여로서 온전히 인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Adriana Varejão는 단순한 위대한 브라질 예술가일 뿐만 아니라 우리 포스트식민 세계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예술가입니다.
- 미셸 푸코, “권력의 눈”, 장-피에르 바루와 미셸 페로와의 인터뷰, 벤담, “파놉티콘”, 파리, 벨퐁, 1977.
- 자크 데리다, “문자학에 대하여”, 파리, 에디션 드 미뉘, 1967.
- 요헨 볼츠, “Adriana Varejão: Sutures, fissures, ruínas” 전시 카탈로그, 상파울루 피나코테카, 2022에서 인용.
- 조르주 바타유, “에로티시즘”, 파리, 에디션 드 미뉘, 1957.
- 세베로 사루이, “Escrito sobre um corpo”, 상파울루, 페르스펙티바, 1979.
-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슬픈 열대”, 파리, 플롱, 1955.
- 에두아르 글리상, “다양성의 시학 입문”, 파리, 갈리마르, 1996.
- 로베르토 폰투알, “라틴 아메리카, 감각의 기하학”, 전시 카탈로그, 리우데자네이루 현대미술관, 1978.
- 루이사 두아르테, “아드리아나 바레앙: 차이의 시학을 위하여”, 가고시안 쿼터리,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