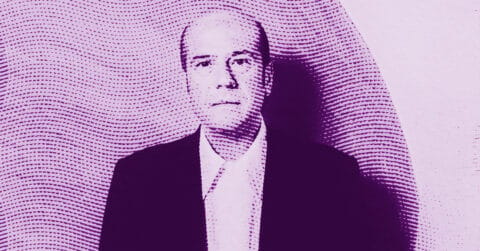잘 들어봐요, 스놉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을 멈추고 셰리 레바인의 아찔한 대담함을 잠시 감상하세요. 1947년에 태어난 이 예술가는 미술사에서 정전으로 여겨지는 작품들을 그대로 차용하여 다시 만들었습니다. 변명하지도, 흔들리지도 않았죠. 레바인이 워커 에반스의 사진을 다시 찍을 때, 에곤 실레의 누드를 다시 그릴 때, 또는 뒤샹의 소변기를 청동으로 주조할 때, 그녀는 단순 복제를 넘어서 예술적 독창성의 근본을 산산조각 내는 지적 용기의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1970년대 말 뉴욕 미술계에 강렬히 등장한 이후, 레바인은 동시대 미술에서 가장 불편한 존재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1981년 메트로 픽처스에서 개최한 그녀의 첫 개인전에서 『워커 에반스 이후(After Walker Evans)』라는 이름의 이제는 유명해진 사진들을 선보이며 미술계에 강타를 날렸습니다[1]. 이 단순하지만 결정적인 행위로 레바인은 위대한 우상파괴자들의 계보에 자신을 위치시키며 작가의 개념에 관한 깊은 성찰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레바인의 예술은 단순한 냉소적인 복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와의 복잡한 협상이며, 남성 거장들이 지배했던 미술사에 여성이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녀가 자넷 맬컴에게 정확히 말했듯이: “여성으로서 저는 제 자리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 모든 예술 시스템은 남성의 욕망 대상들을 찬미하기 위해 설계되었죠. 여성 예술가로서 저는 어디에 위치할 수 있었을까요?” [2]. 이 근본적으로 페미니즘적인 질문이 그녀의 전 작품을 관통합니다.
레바인의 힘은 친숙하면서도 이상할 만큼 새로워 보이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능력에 있습니다. 1996년 작품인『Fountain (Buddha)』는 뒤샹의 소변기를 폴리시드 브론즈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원작은 1917년 이미 급진적인 도발 행위였지만, 레바인의 손을 거쳐 더욱 모호해진 조각품으로 변모하여, 뒤샹뿐만 아니라 브랑쿠시까지 연상시키는 소중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작가 자신도 놀라움을 표한 바 있죠[3]. 단순한 레디메이드가 아니라, 뒤샹이 제거하려 했던 새로운 관능과 아우라가 실린 물체가 된 것입니다.
레바인의 작업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프랑스 후기 구조주의와 문학 이론이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녀의 작업은 미셸 푸코가 말한 “작가-기능”의 완벽한 구현체로, 작가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의미 생산을 조직하고 통제하는 문화적 구성물이라는 개념입니다[4]. 레바인은 에반스를 재사진하거나 뒤샹을 재현함으로써, 특정 이름들이 강력한 문화적 상징(signifiant)이 되고 권위와 가치를 부여받는 메커니즘을 드러냅니다.
푸코의 지식과 권력 간 관계에 대한 이론은 레빈의 차용적 제스처에서 완벽하게 시각적으로 표현된다. 그녀가 미술사 속 대표 이미지들을 포착할 때, 그녀는 어떤 작품들이 정전으로 선정되고 어떤 작품들이 주변화되는지를 결정하는 권력 구조를 드러낸다. 워커 에반스 같은 사진작가들에 대한 그녀의 관심은 우연이 아니며, 이 이미지들이 어떻게 문화적 기념비가 되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소장한 박물관과 역사책에서 특권적 지위를 획득했는지를 질문하는 것이다.
푸코는 담론이 스스로의 대상을 어떻게 구축하는지, 단순히 묘사하는 것을 넘어 무엇을 생산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었다. 레빈의 작품은 정확히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며, 단지 세상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재현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그녀가 에드워드 웨스턴이 자신의 아들을 나체로 찍은 사진들을 재현할 때, 단순히 그 이미지를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진들이 특정 남성 이상을 구축하는데 어떻게 참여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진들이 몸의 대상화라는 오랜 전통에 어떻게 속하는지를 드러낸다[5].
레빈의 작업은 또한 예술에서 시간 개념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다. 과거의 작품들을 차용하면서 그녀는 철학자 자크 랑시에가 말하는 “의도적인 시대착오”를 창조하는데, 이는 역사를 직선적이고 진보적인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인식을 혼란에 빠뜨리는 시간적 충돌이다[6]. 그녀의 차용은 시간을 탐험하는 기계처럼 작동하며, 예술적 진보 개념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간적 단락을 만들어낸다.
랑시에에 따르면, 현대 미술은 바로 과거의 형태를 재작업하여 현재 속에서 재활성화하는 능력으로 특징지어지며, 미학은 예술 이론이 아니라 “감각적 구성”, 즉 특정 시기에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으며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조직하는 방식이다[7]. 레빈의 작업은 바로 이 수준에서 개입하며, 이미지를 한 맥락에서 다른 맥락으로 옮기고 가시성의 기존 위계질서를 교란함으로써 감각을 재구성한다.
그녀의 “After Ernst Ludwig Kirchner” (1982) 시리즈를 살펴보자. 여기서 그녀는 키르히너의 표현주의 인물들을 가져오지만 그들의 원래 표현성을 비운다. 이 행위는 단순한 형태적 차용이 아니라, 근대 예술에서 표현의 위상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다. 레빈은 여기서 현대주의의 창립 신화 중 하나인, 예술이 주관적 내면성의 진정한 표현이라는 생각에 도전한다. 표현주의 형태를 다시 가져오되 그들의 추정된 감정적 무게를 제거함으로써 그녀는 이 진정한 표현이라는 개념의 구축된 성격을 드러낸다[8].
레빈의 작품에 내재된 이러한 정치적 차원은 종종 보다 형식적이거나 개념적인 해석에 밀려 과소평가된다. 그러나 크레이그 오웬스가 지적했듯이, 그녀의 작업은 지배적 재현 체계에 대한 페미니스트적 비판에 완전히 속한다[9]. 레빈은 남성들이 제작한 정전 작품들을 차용하면서 단지 예술적 독창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술 분야에서 상징적 권력의 젠더 분배에도 도전한다.
레빈의 천재성은 시스템을 비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그 안에 존재하는 것임을 이해한 데 있다. 확립된 전통 외부에서 “진정한 여성적” 예술 언어를 찾기보다, 그녀는 이 전통들을 내부에서 점유하고, 기생하며,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선택했다. 이는 랑시에가 “불협화적”이라고 부를 전략으로, 단순한 정면 대결이 아니라 감성의 좌표들을 미묘하게 재구성하는 것이다[10].
그녀의 “Melt Down” 그림들(1990)은 유명한 그림들의 색을 수치적으로 평균 낸 단색화들이다. 복잡한 작품들을 하나의 균일한 색으로 축소함으로써, 레빈은 일종의 이중 추상을 실행한다. 이미 추상화된 것을 다시 추상화하는 것이다. 이로써 그녀는 현대주의 추상의 임의성을 드러내며, 보편적 진리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위치된 관습임을 밝힌다. 이 단색화들은 마치 그림의 유령과 같으며, 미술사의 유령적 존재들이다[11].
이 유령 같은 차원은 그녀의 “Knot Paintings”(1985)에서 특히 뚜렷한데, 합판 판넬 위에 나무의 옹이들을 선명한 색으로 그린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은 자연이 항상 이미 코드화되고 문화적 의미로 표시되어 있다는 생각을 다룬다. 자연스러운 “사고”인 나무 옹이들이 그녀의 붓 아래에서 의도적인 기호가 되며, 이미 존재했던 것을 강조하는 역설적인 예술적 의도성의 표시가 된다[12].
레빈의 작업은 우리로 하여금 미술사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고하도록 초대한다. 미술사를 숭배하거나 거부하는 유산이 아니라, 복잡하고 양가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동적인 힘의 장으로 보는 것이다. 그녀의 작품은 랑시에가 말한 “미학적 불안”을 구현하며, 이는 현대 미술 경험에 내재된 모순에 대한 예리한 의식이다[13].
레빈이 현대주의 작품들을 재활용하는 이유는 사랑과 비판이 공존하는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그녀 자신이 말했듯이: “나는 고도 현대주의의 유토피아적·디스토피아적 측면을 붕괴시키려고 시도한다”[14]. 이는 단순한 냉소적 해체가 아니라, 전통의 한계를 드러내면서도 그 전통을 생생하게 유지하는 모호한 경의다.
이러한 양면성은 “La Fortune (After Man Ray)”(1990)에서 특히 잘 드러난다. 만 레이의 그림에서 영감을 받은 호화로운 당구대로, 초현실주의 이미지를 호화로운 물리적 대상으로 전환함으로써, 레빈은 재현과 현실, 상품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예술과 고급 상품으로서의 예술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이 테이블들은 예술가가 말한 “상품이 숭고와 만나는 이 기묘한 영역”을 완벽하게 구현한다[15].
레빈의 힘은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능력에 있다. 그녀는 현대 미술에 대한 이상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대신, 그 잔해 속에 머무르며 고고학자가 사라진 문명을 탐험하듯 탐험한다. 이를 통해 그녀는 우리의 문화 유산과 더 복잡한 관계를 맺도록 초대하며, 맹목적 숭배도 단순한 거부도 아닌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수용의 형태를 제안한다.
로드첸코의 사진, 몬드리안의 “chevrons”, 브랑쿠시의 조각을 재해석한 작품에서 레빈은 방법론적인 시대착오적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는 서로 다른 예술적 시간대를 대화하게 하여 과거와 현재 사이에 생산적인 단락을 창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녀의 작업은 예술사가 항상 독창성으로 나아가는 선형적 진보가 아니라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힘의 장임을 보여줍니다.
셰리 레빈의 작품은 예술과 그 역사를 근본적으로 재고하도록 초대합니다. 무작정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보다 이미 본 것, 이미 행해진 것의 아직 탐구되지 않은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 더 흥미로울 수 있음을 제안합니다. 이미지가 넘쳐나고 독창성을 강요하는 것이 광고 문구가 된 세상에서, 레빈의 전략은 놀랍도록 적절하게 다가옵니다. 반복이 반드시 무의미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장소가 될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니 다음에 셰리 레빈의 작품, 예컨대 워커 에반스의 사진을 재해석한 작품, 청동 분수, 디지털 단색화 등을 감상할 때, 단순한 복제물이 아니라 오늘날 예술 행위의 의미에 관한 깊은 질문임을 기억하세요. 이 질문은 그 적절성과 전복적 힘을 한결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 더글라스 크림프, “그림들”, October, 8권 (1979년 봄).
- 재닛 말콤, “시대정신의 소녀”, The New Yorker, 1986년 10월 20일, 하워드 싱거먼 인용, Art History, After Sherrie Levine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 출판부, 2012).
- 셰리 레빈, 마사 버스크릭 인터뷰, October, 70권 (1994년 가을).
- 미셸 푸코, “작가란 무엇인가?”, Bulletin de la Société française de philosophie, 63년 차, 3호, 1969년 7월-9월.
- 엘레오노라 밀라니, “셰리 레빈: 판별 불가능성의 문제”, Flash Art, 2016.
- 자크 랑시에르, “시대착오 개념과 역사가의 진실”, L’Inactuel, 6호, 1996.
- 자크 랑시에르, 감각의 분배: 미학과 정치 (파리: La Fabrique, 2000).
- 하워드 싱거먼, Art History, After Sherrie Levine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 출판부, 2012).
- 크레이그 오웬스, “타인의 담론: 페미니스트와 포스트모더니즘”, The Anti-Aesthetic: Essays on Postmodern Culture, 할 포스터 편집 (포트 타운젠드: 베이 프레스, 1983).
- 자크 랑시에르, 해방된 관객 (파리: La Fabrique, 2008).
- 로버타 스미스, “아첨 (진심?) 아이러니가 은근히 가미됨”, The New York Times, 2011년 11월 10일.
- 엘렌 트레스푸슈, “셰리 레빈, 차용주의에서 시뮬레이션주의로”, Marges, 17호, 2013.
- 자크 랑시에르, 미학에서의 불편함 (파리: 갈릴레, 2004).
- 셰리 레빈, 마사 버스크릭 인터뷰, October, 70권 (1994년 가을).
- 위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