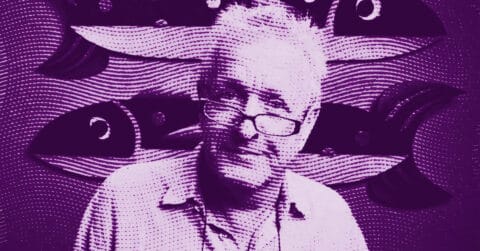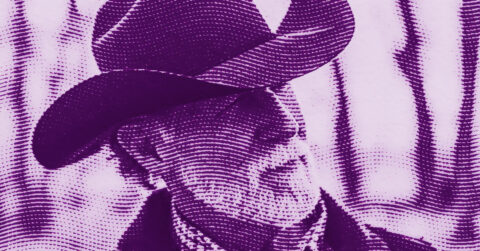잘 들어봐요, 스놉 여러분, 현대 미술의 이 외계 생명체 인베이더에 대해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1996년부터 그는 대담함으로 우리 도시들을 점령하며 예술계 기득권을 흔들어 놓았죠. 그의 픽셀 모자이크는 우리 도시 공간에서 가장 끈질긴 바이러스가 되어, 날씨와 파괴자, 그리고 고가로 되팔려는 미술상들에 맞서 저항하고 있어요.
인베이더는 제도화된 낙서와 도시적 시를 완벽히 결합해 고대 모자이크를 미래적인 팝 문화의 전파체로 변모시켰습니다. 그의 픽셀화된 작은 외계인들은 1978년 게임 스페이스 인베이더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이제는 원작 디지털 캐릭터보다도 더 유명해졌죠. 침략은 1998년 바스티유 근처에서 첫 작품으로 시작되어 파리 전역과 전 세계로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100개 도시에서 4200개 이상의 “인베이더”를 볼 수 있으며, 칸쿤의 해저부터 국제우주정거장까지 그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면 쓴 남자에게서 제가 좋아하는 점은 그의 작품을 뒷받침하는 개념적 지능입니다. 인베이더는 단순한 도시 타일러가 아닙니다. 그는 도시 공간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통찰력 있는 사회학적 사상을 구현합니다. 그의 행보는 우리의 공유 공간이 점점 사유화되는 현실과 마주하게 합니다.
픽셀 시대의 푸코 이론에 기반한 이질적 공간
미셸 푸코는 1967년 강연 “다른 공간들”(Des espaces autres)에서 일반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여러 공간이 중첩되는 현실의 장소인 이질적 공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1]. 인베이더의 모자이크는 정확히 이러한 이질적 공간처럼 작용하여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식하는 도시 공간에 균열을 만듭니다. 역사적 건물의 벽에서 스페이스 인베이더를 맞닥뜨릴 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충돌하는 경험을 하며 환경과의 수동적인 관계를 교란합니다.
“이질적 공간은 단일 현실 장소 안에 본질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여러 공간, 여러 위치들을 병치시키는 능력을 지닌다,”고 푸코가 썼습니다. 인베이더의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디오 게임 세계와 현실 세계, 가상과 실체를 병치시켜 우리가 도시를 경험하는 일상에 균열을 만듭니다.
인베이더는 그의 모자이크를 통해 우리에게 도시 공간을 놀이와 탐험의 장소, 거리 구석구석이 놀라움으로 가득한 모험의 무대로 재발견하도록 초대합니다. 그는 35만 명 이상이 다운로드한 플래시인베이더스(FlashInvaders) 앱을 통해 예술 작품 사냥을 즐거운 탐험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이러한 예술 경험의 게임화는 “인베이더 사냥꾼”들이 평소 방문하지 않던 동네를 탐험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미술을 박물관이라는 무균 공간에 가두고 소비하는 전통 방식을 멋지게 전복하는 행위입니다.
푸코의 사상은 이 작은 타일 외계인들이 우리의 시간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뒤흔드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Invader가 그의 작품들을 역사적인 기념물에 설치함으로써 그는 과거에 대한 우리의 숭배를 의문시하는 시간의 단락을 창조한다. 그는 고대의 모자이크 장인정신과 비디오 게임의 픽셀화된 미학을 한 시각 공간에 공존하게 하여 시간적 현기증을 일으키고, 이는 우리로 하여금 유산에 대한 태도를 재고하도록 만든다. 루브르 박물관이나 이에나 다리와 같이 역사가 깊은 장소에서의 그의 개입은 단순한 반달리즘 행위가 아니라 종종 수동적인 관조에 갇힌 공간을 활성화하는 세대 간 대화다.
푸코가 강조하듯 “헤테로토피아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전통적인 시간과 절대적으로 단절되는 순간에 제대로 기능하기 시작한다.” 이는 바로 우연히 만난 Space Invader가 만들어내는 것으로, 우리 도시 시간에 대한 선형적 인식에 균열을 낸다.
도시 표류의 상황주의적 경험
Invader가 우리를 매혹시키는 이유 중 하나는 그의 작품이 상황주의 운동과 그들이 제기한 스펙터클 사회 비판의 유산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 운동의 중심 인물인 기 드보르는 심리지리학 개념을 개발하며, 지리적 환경이 개인의 감정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2]. 도시 표류, 즉 다양한 분위기를 빠르게 통과하는 이 기법은 Invader의 작품에서 가장 완성된 현대적 표현을 찾는다.
FlashInvaders 게임 애호가들은 상황주의 표류를 실천한다: 그들은 경제적 혹은 실용적 필연성이 아닌 미적 경험을 탐구하기 위해 도시를 헤맨다. 드보르가 설명했듯이, “1인 또는 그 이상이 표류에 몰두할 때, 그들은 자신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동 및 행동의 이유, 관계, 일과 여가를 일정 기간 포기하고, 현장과 그에 따른 만남의 자극에 자신을 맡긴다.”
Invader가 이루는 것은 실로 혁명적이다(이 다소 남용된 단어를 쓰지 않고도): 그는 우리가 도시를 수동적으로 경험하는 방식을 적극적 참여로 바꾼다. 그의 모자이크 작품은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건물 외관을 살피고, 결코 주목하지 않았던 도시 구석구석을 발견하게 만든다. 그는 우리를 무감각한 공공 공간 소비자가 아닌 도시 탐험가로 만든다.
Invader 작품의 놀이적 측면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상황주의자들은 놀이를 일상의 소외에 맞선 일종의 저항으로 보았다. Invader는 그의 작품을 찾는 행위를 진정한 도시 게임으로 변형시킴으로써, 너무 기능적인 우리 도시들에 자본주의적 도시 공간 논리를 전복하는 놀이적 차원을 재도입한다. 그의 모자이크는 상업 논리를 벗어난 창의적 자유가 발휘되는 임시적 자율 구역을 대표한다.
Invader가 글로벌 기업 본사 벽이나 은행 외관에 Space Invader를 붙일 때, 그것은 단순한 장식 행위가 아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이 공간들의 원래 기능을 전유하는 상징적 행위다. 모자이크는 점차 사유화되는 공공 공간에 대한 저항의 행위이며, 도시는 그것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그 공간을 삶의 터전으로 삼는 이들의 것임을 상기시킨다.
사회학자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는 상황주의자들과 가까웠으며 “도시권리”를 기본권으로 옹호했습니다. 인베이더(Invader)의 침입은 이 권리의 구체적인 표현, 즉 도시 공간을 주민들을 위해 그리고 주민들에 의해 상징적으로 재점유하는 행위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의 작품을 모두가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 설치함으로써, 인베이더는 예술 경험을 민주화하고 현대 미술 시장의 배타적 논리를 도전합니다.
드보르(Debord)가 말했듯이, “새로운 행동의 산물이자 도구가 되는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인베이더가 수행하는 바로 그 일입니다: 그는 도시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재구성하여 도시 내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분위기를 창조합니다.
그의 작품의 장수성 또한 우리의 시대의 가속화된 시간성에 대한 일종의 도발입니다. 일시적인 그래피티와는 달리, 그의 모자이크는 시간을 견디며 도시 경관의 일부가 됩니다. 이 상대적 영속성은 우리의 사물 및 이미지에 관한 관계를 지배하는 계획된 진부화(logique de l’obsolescence programmée)에 도전합니다. 그의 스페이스 인베이더(Space Invaders)는 세월을 지나는 동안 지워지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미의 층을 쌓아가는 시대의 시간적 표식이자 증인입니다.
인베이더가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때로는 자유를 위태롭게 하면서 모자이크를 설치할 때, 그는 상황주의자의 전유와 놀이 정신을 잇고 있습니다. 그는 불법 행위를 예술적 퍼포먼스로, 벤달리즘을 공동체에 대한 선물로 바꿉니다. 그의 야간 “침입”은 예술가가 잠든 도시를 재점유하여 공공 공간을 규율하는 통제 장치들을 일시적으로 회피하는 도시적 표류입니다.
스트리트 아트를 넘어서는 완전한 개념미술 작품
인베이더를 단순한 스트리트 아티스트로 국한하는 것은 축소해석일 것입니다. 그의 작품은 스트리트 아트를 훨씬 넘어 퍼포먼스, 설치, 사진 심지어 디지털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개념적 접근에 속합니다.
각 모자이크는 세심하게 문서화되고 지리적 위치가 지정되며, 자체로 하나의 작품인 데이터베이스에 통합됩니다. 이 기록적 차원은 온 가와라(On Kawara)나 한네 다르보벤(Hanne Darboven) 같은 개념 미술가들과 인베이더를 가깝게 만듭니다. 이들은 체계적인 문서화를 독립적인 예술 형식으로 삼았습니다. 니콜라 부리오(Nicolas Bourriaud)가 그의 “관계 미학(Esthétique relationnelle)”에서 설명하듯, 현대 미술은 형식적 속성보다는 관객과 맺는 관계로 정의됩니다[3]. 인베이더의 작품은 관계미술의 전형으로서, 플래시인베이더스(FlashInvaders) 앱을 통해 모자이크와 상호작용하는 “사냥꾼”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들의 발견을 기록하며 정보를 교환합니다.
인베이더가 대부분의 스트리트 아티스트와 구별되는 점은 그의 체계적 시각과 거의 과학적인 논리입니다. 그는 도시 공간에 일시적으로 개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유한 지도화와 함께 지구적 침입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각 모자이크는 독특하며 번호가 매겨지고 분류됩니다. 전체는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우리 행성을 거대한 놀이터로 변모시킵니다. 이 전체성 차원은 20세기 주요 아방가르드들의 예술로 사회를 변혁시키려는 야망을 떠올리게 합니다.
Invader의 “루빅큐브즘”은 루빅스 큐브를 사용하여 만든 그림들로, 대중 예술과 고급 예술 사이의 경계를 초월하려는 그의 의지를 보여준다. Courbet의 “세상의 기원”이나 Leonardo da Vinci의 “모나리자” 같은 미술사 아이콘을 색색의 큐브로 재해석함으로써, Invader는 아이러니한 전유의 뒤샹 전통에 속한다. 그는 Marcel Duchamp가 모나리자에 콧수염을 그린 우상파괴 행위를 픽셀과 놀이라는 현대의 수단으로 현재화한다.
Invader의 접근법은 디지털 시대에 원본과 복제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그의 모자이크는 각각이 수작업으로 제작되어 유일무이하면서도 대중문화에서 온 모티프를 사용하고 “별칭(alias)” 형태로 예술 시장에서 복제되기도 하는 다중성을 가진다. 유일성과 복제가능성 간의 이 변증법은 Walter Benjamin이 기술적 복제 가능성 시대의 예술 작품에 대해 분석한 내용과 공명하며,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갱신된다.
1999년 할리우드 간판 침범이나 2012년 성층권에 모자이크를 보내는 등 Invader의 가장 극적인 “침략”은 설치 미술만큼이나 퍼포먼스 예술에 가깝다. 이러한 매체가 된 행동들은 그의 활동 영역을 전통적인 도시 공간을 넘어 확장하여 상징적이거나 접근 불가능한 장소를 정복한다. 이렇게 해서 그는 도시 미술의 물리적·개념적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
2015년 유럽우주국(ESA)과 협력하여 국제우주정거장에 모자이크를 설치한 것은 권위 있는 기관에 침투하면서도 자신의 반체제적인 행보를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문자 그대로 우주 공간의 침입은 아마도 그의 경력에서 지금까지 가장 정점에 이른 순간이며, 지구적 침략 프로젝트의 논리적 완성이다.
즉각 알아볼 수 있는 미학을 개발하면서도 익명을 유지하는 Invader는 역설적으로 작품 뒤에 사라지는 현대 예술가상을 구현한다. 그의 가명과 가면은 단순한 법적 대응 수단이 아니라, 대중의 매혹을 자아내는 신화적 캐릭터를 만드는 예술적 행위의 일부다.
Invader의 작품은 또한 공공 공간에서 무단 예술 개입의 정당성에 관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다. 허가 없이 모자이크를 설치함으로써 그는 공식 규제를 초월하는 도시 권리를 주장한다. 그의 작업은 우리에게 묻는다: 도시 공간은 진정 누구의 것인가? 누가 그것을 변화시킬 권리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우리의 도시가 관광객과 투자자를 위한 마케팅 상품이 되어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2018년 부탄에서의 개입은 역사적 수도원에 모자이크를 부착하여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는 그의 작업에 내재된 긴장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 지역 문화와 성지에 대한 존중에 비추어 예술 개입의 한계를 묻는다. 이러한 논란은 그의 작품에 불가분의 일부로, 공공 공간과 유산에 대한 우리의 관계에 내재한 모순을 드러낸다.
처음에는 반달리즘으로 여겨졌던 그의 모자이크가 오늘날 지방 자치단체와 주민들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자발적인 “재활성화자”들이 훼손되거나 도난당한 작품을 복원하며 예술가의 작업을 계승하는 공동체를 형성한다. 이 변화는 Invader가 도시 공간과 현대 유산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보여준다.
Invader는 문화적, 언어적 장벽을 초월하는 보편적으로 인식 가능한 시각 언어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픽셀화된 캐릭터들은 도쿄, 파리, 뉴욕 어디에서나 이해되며, 국경을 뛰어넘는 일종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확립합니다. 이러한 보편성은 현대 디지털 기술이 아닌 고대 매체인 모자이크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Invader의 작품은 디지털 시대의 공공 공간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가장 적절하게 비판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흥미로운 역설로, 그는 가상 세계의 아이콘을 구체화함으로써 우리에게 도시의 물리적 현실을 재발견하도록 촉구합니다. 그의 모자이크 작품은 잠시 동안 스크린에서 벗어나 현실 세계를 바라보게 하며, 이는 우리 시대를 특징짓는 가상 세계에의 몰입 움직임을 반전시키는 것입니다.
Invader는 단순한 “유행하는 태거” 이상입니다: 그는 예술사, 도시 사회학, 미디어 비평을 아우르는 컨셉추얼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작업 방식은 현대 세계와 그 모순에 대한 뛰어난 지성을 보여줍니다. 우리 도시를 채우는 작은 픽셀화된 캐릭터들은 현실과 가상의 중간 지점에서, 개인과 집단, 일시성과 영속성 사이에서 우리의 현대 도시 조건에 관한 가장 깊은 성찰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공공 공간이 점점 더 사유화되고 감시되며 상업화되는 시대에, Invader의 침입은 시적 저항 행위로서 도시가 먼저 그것을 삶과 꿈의 장소로 만드는 이들의 것임을 상기시켜줍니다. 각 작은 타일 외계인은 수동적인 공간 소비자가 아닌 도시 탐험가가 되라는 초대입니다.
이 낯선 작은 캐릭터들은 우리 일상 환경의 낯섦을 재발견하고 도시를 새롭게 보는 눈을 갖자고 권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Invader의 가장 큰 성과일 것입니다: 우리 거리들을 모험의 장으로, 우리의 벽들을 야외 갤러리로, 그리고 우리 각자를 잠재적인 예술 발견자로 변화시켰다는 점입니다.
- Foucault, Michel. Des espaces autres, Cercle d’études architecturales 강연, 1967년 3월 14일, Architecture, Mouvement, Continuité, 제5호, 1984년 10월에 게재.
- Debord, Guy. Théorie de la dérive, Les Lèvres nues 제9호, 1956년 12월, Internationale Situationniste 제2호, 1958년 12월에 재게재.
- Bourriaud, Nicolas. Esthétique relationnelle, Les Presses du réel,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