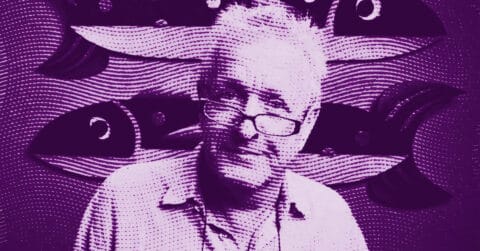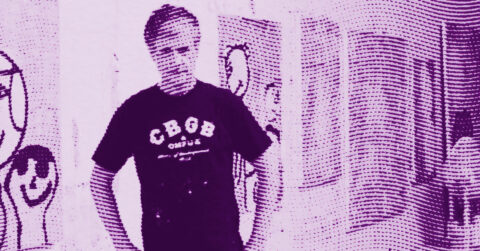잘 들어봐요, 스놉 여러분. 우리는 현대 미술이 화려한 나르시시즘에 빠져 작품들이 진정한 탐구보다는 자아 과시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필리핀-일본 화가 저스틴 카귀앗 같은 예술가가 나타나 캔버스를 또 다른 차원의 관문으로 바꿉니다. 그의 거대한 느슨한 캔버스 위 그림들은 만화경 같은 우주로 우리를 데려가며, 형상과 유기적 형태들이 우리의 인식 경계에서 춤추는 것 같습니다.
카귀앗의 작품들은 색채의 소용돌이를 만듭니다. 유화 표면과 때때로 고흐슈 기법이 겹겹이 쌓여 멀리서 오딜롱 르동의 울림을 연상케 합니다. 마치 그가 다른 생에서 정신약물 상태에서 계속 그림을 그린 듯한 느낌입니다. 이 울림은 우연이 아닙니다: 카귀앗은 상징주의 유산에서 공개적으로 영감을 받았으며, 19세기 말의 그 예술가들처럼 그도 무자비한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마법과 신비의 원천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카귀앗의 작업에는 깊이 영화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의 그림들은 천천히 움직이는 영화, 최근 전시에서 사용된 표현대로 “슬로 시네마”로 기능합니다[1]. 작가가 비디오 같은 다른 매체도 탐구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약 10년 전 VHS 카메라로 촬영한 “Carnival” 같은 작품이 있습니다. 그의 그림들에서는 안료가 서서히 산화하고, 색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미묘하게 변해 복제 불가능한 시각적 경험을 창출하며 오랜 관조를 요구합니다. 그의 작품을 사진으로 재현하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직접 보면서 느슨한 캔버스 위 색들의 별자리를 눈으로 쫓아야 합니다.
카귀앗의 전략은 빛납니다: 그는 추상을 해석의 잠재력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예술가 자신도 작업실에서의 실천과 언어, 특히 서술을 분리함으로써 작품이 완성되기 전에 설명하거나 묘사해야 하는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인정합니다. 이러한 내러티비티에 대한 저항은 역설적입니다. 그의 회화는 언어에 도전하면서도 의미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예술가 샤를린 폰 헤일이 잘 표현한 바와 같이: “회화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은 언제나 무언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명명할 수 없는 그 어리석음의 핵심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2].
카귀앗을 많은 현대 화가들과 구별 짓는 점은 그가 단순한 인용에 빠지지 않고 놀랍도록 광범위한 영향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는 만화와 일본 판화의 평평한 형태에서 영감을 얻고, 필리핀 가톨릭 아이콘의 바로크-민속이 혼합된 미학을 비엔나 분리파의 세련된 모더니즘과 융합합니다. 그 결과는 현대적이면서도 시대를 초월한 것으로, 마치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경계를 넘어 독특한 시각 언어를 창조한 것 같습니다.
카귀앗과 문학의 관계는 특히 흥미롭습니다. 출판된 시인이기도 한 그는 종종 전시회에 시각적 세계의 확장으로 기능하는 텍스트를 동반합니다. 런던 모던 아트 갤러리에서 열린 “Permutation City 1999” 전시를 위해, 그는 도쿄, 마닐라, 캘리포니아 만 지역에 대한 단편적이고 허구적인 기억들을 불러일으키는 글을 썼습니다. 이 제목은 1994년에 출판된 그렉 이건의 공상 과학 소설에서 빌린 것으로, “순열”이란 “순서가 매겨지거나 배열될 수 있는 집합 또는 수량”으로 정의되며, 각 그림을 카귀앗의 텍스트와 추상적으로 연관 지어 읽을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합니다. 공상 과학을 개념적 틀로 사용하는 이 접근법은 예술가의 다중 시간성 및 대안적 현실에 대한 관심을 드러냅니다.
“The saint is never busy”나 “to the approach of beauty its body is fungible”와 같은 작품에서, 인물들은 점들의 장막을 통해 흐릿하게 그려져 텍스트 속 기억의 단편을 떠올리게 합니다. 선명한 색채는 상세한 만화경 무늬로 조직됩니다. 때때로 짙은 회색이나 검은 얼룩이 표면을 가로지르는 빛의 평면처럼 퍼집니다. 이 전체에서 인물, 풍경, 그리고 다른 세계의 장면들이 시각과 비가시성 사이에서 떠돌며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카귀앗의 캔버스는 “독성 숭고” 개념을 연상시키는 특성을 지닙니다. 그의 내면 풍경은 시각적 매력과 불안한 낯섦을 결합합니다. “Gretel in Pharmakon”(2022)에서 한 인물은 순진한 아이일 수도 있고 그녀를 괴롭히는 마녀일 수도 있습니다. 카귀앗의 불확정성에 대한 성향은 “pharmakon”이라는 용어의 사용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 이론적 개념은 독이면서 동시에 해독제, 즉 자기 파괴를 수용할 수 있는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카귀앗의 흥미로운 점은 기억 메커니즘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그의 캔버스들은 재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작용을 모방하는 과정입니다. 소피 루이그록이 쓴 바와 같이, 그의 회화는 “원초적 수프처럼 읽히며”, 그 층들은 서로 녹아들어 무늬와 형태를 구축합니다. 회화, 아이디어, 정보, 인물과 장식의 전환은 기억의 해체처럼 분절되어 있습니다.
카귀앗의 작품에서 내가 좋아하는 점은 시간과의 관계입니다. 그의 Wesleyan 대학교에서 열린 “Triple Solitaire” 전시에서 그는 작업실에서 갤러리로 옮겨지면서 환경의 화학적 조성에 반응해 산화되는 안료로 만든 그림들을 전시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또한 그림 위에 은박을 바르고 다시 그 위에 유화 유성유를 도포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은박을 산화시켜 반사 성질을 잃게 하는 거울 그림도 선보였습니다. 몰리 주커먼-하툥이 강조한 것처럼: “회화는 일상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며, 시계의 시간을 일상을 넘어 영원의 시간으로 확장하고 변형시키는 능력을 지닙니다” [3].
카귀앗의 작품은 우리 시대의 특징인 기계적 재현 가능성에 도전합니다. 그의 회화들은 물리적인 존재감과 신체적 몰입을 요구합니다. 그것들은 진정한 미적 경험은 화면 속 이미지로 환원될 수 없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2022년작 “Hysteresis Loop”에서 그는 열감응 안료와 금속 바탕의 뒷면에 부착한 방사 센서를 사용하여, 온도가 프로그래밍된 루프를 따라 상승하고 하강함에 따라 작품이 느리지만 극적인 색 변화의 일련을 겪도록 합니다.
카귀앗의 작업이 매우 매혹적인 이유는 고대적인 동시에 미래적인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마치 신비한 태피스트리나 붕괴된 미래의 프레스코화처럼, 그의 그림들은 의미가 가득하지만 서사의 매력에 저항하며, 언어와는 낯선 감각적 경험의 즉시성을 요구합니다.
나는 앞으로 수년 내에 중요성이 더욱 커질 한 예술가의 출현을 목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귀앗은 쉽게 정의할 수 있거나 단순한 꼬리표로 묶을 수 없는 독특한 시각 우주를 창조해냈습니다. 그의 작품은 우리에게 속도를 늦추고, 관조하며, 가시적인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알려진 것과 미지의 것의 경계에 존재하는 세계에 빠져들 것을 권장합니다.
화려한 몸짓이나 도발적 선언으로 관심을 끌려 애쓰는 많은 예술가들이 있는 시대에 카귀앗은 성찰과 깊이의 길을 선택합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단순히 분열된 세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지하고 체험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공하는 예술. 아직 그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의 작품을 보러 달려가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 전시 팜플렛: “저스틴 카귀아트 트리플 솔리테어(Justin Caguiat Triple Solitaire)”, 2024년 9월 17일~12월 8일, 에즈라와 세실 질카 갤러리, 웨슬리안 대학교 예술 센터.
- 샤를린 폰 하일(Charline von Heyl) 인용, 전시 “트리플 솔리테어”, 웨슬리안 대학교, 2024년.
- 몰리 주커먼-하퉁(Molly Zuckerman-Hartung), “회화에 관한 95개 명제(The 95 Theses on Painting)”, 몰리 주커먼-하퉁 및 타일러 블랙웰 편집, 몰리 주커먼-하퉁: 코믹 릴리프(COMIC RELIEF), 인벤토리 프레스와 휴스턴 대학교 블래퍼 아트 뮤지엄, 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