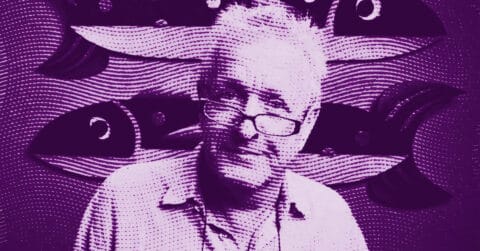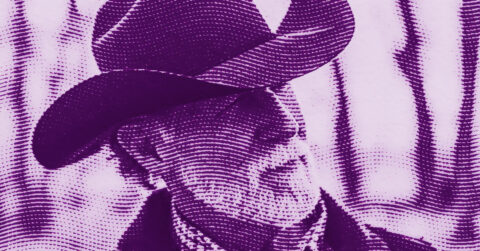잘 들어봐요, 스놉 여러분. 고헤이 나와는 단순한 예술가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 인식을 체계적으로 부수는 암살자입니다. 이 일본 조각가는 사냥 트로피 같은 평범한 물건을 덮은 투명한 구체들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재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시죠? 바로 이것이 화면에 의해 무뎌진 우리의 뇌가 픽셀과 현실을 혼동하는 이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1975년 오사카에서 태어난 나와는 인간 지각과 물질성 사이의 인터페이스로서 표면을 탐구하는 작품들로 국제적인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가 직접 “픽셀”과 “셀”을 결합해 만든 상징적인 시리즈 “PixCell”은 디지털 정보 과잉 시대를 완벽하게 상징합니다. 자연 박제 동물에 유리 구슬을 덮어 확대 렌즈처럼 작용하는 이 작품들은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에 의문을 갖게 하는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나와의 작품에서 제가 감탄하는 점은 우리의 감각 경험을 변형시키는 현상학적 능력입니다. 그의 구체들로 덮인 사슴을 볼 때 저는 단순히 디스코 볼로 가장한 박제 동물을 보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마치 모리스 메를로퐁티가 갑자기 일본의 전위 조각가가 된 것처럼 지각의 근본적 재구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메를로퐁티는 우리의 몸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단이며 우리의 지각은 몸으로 구현된 것임을 가르쳤습니다[1]. 나와는 이 생각을 더 발전시켜 의도적으로 우리의 감각을 교란시키고 인지 장치의 한계를 인식하게 만드는 작품을 만듭니다.
프랑스 철학자는 그의 저서 『지각의 현상학』에서 “고유한 신체는 유기체 내의 심장과 같이 세계 안에 있다”고 썼습니다[2]. 이 생각은 나와가 그의 작품에 투명 구체들을 덮는 의도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이 거품들은 단순히 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물과 맺는 복잡한 지각 관계를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와가 직접 설명하듯이, “사물이 다양한 크기의 구체(세포)로 완전히 덮여 표면이 개별 세포로 분할되면, 그것은 확대하고 왜곡하는 렌즈를 통해 ‘보일’ 준비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메를로퐁티가 우리에게 이해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지각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고 항상 이미 해석입니다.
나와의 창작물들은 우리가 지각 행위를 의식하는 체현된 경험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의 조각품들은 관조하는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감각을 통해 현실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인식하게 하는 능동적인 촉매제입니다. 이런 현상학적 예술 접근법은 메를로퐁티가 “사물은 그것을 지각하는 누군가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 글을 떠올리게 합니다[3].
그의 건축과의 연관성은 명백하다. 건축은 단순히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조율하며 우리의 인식과 움직임을 변화시킨다. 나와 또한 그의 조각과 설치 작품을 통해 마찬가지다. 그의 설치 작품 “Force”를 보라, 실리콘 오일이 천장에서 끊임없이 가느다란 줄기로 떨어져 작은 웅덩이를 이룬다. 이것은 일종의 액체 건축물이 아닌가? 나와는 콘크리트와 강철 대신 유동적인 재료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안도 다다오 건축가가 자연광을 조작하여 공간 경험을 변화시키듯, 나와는 재료를 조작하여 우리의 지각 경험을 변형시킨다 [4].
2016년에 완성된 히로시마 인근의 예술 파빌리온 “Kohtei”라는 그의 건축 프로젝트에서, 나와는 예술과 건축 사이의 전통적인 경계를 초월한다. 유기적인 형태와 금속으로 된 천공된 외피를 가진 이 구조물은 그의 조각적 탐구의 확장이 된다. 단순한 건물이 아닌, 거주 가능한 조각이자 우리의 모든 감각을 자극하고 내부와 외부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공간이다.
건축 평론가 케네스 프램튼은 건축에서 “텍토닉(tectonics)”을 “사물을 연결하는 예술”로 정의했다 [5]. 나와는 이 원리를 건축 프로젝트뿐 아니라 조각 작품에도 적용한다. 그의 작품 “PixCell”은 연결성에 관한 것으로, 세포/픽셀이 어떻게 하나의 전체를 형성하기 위해 연결되는지, 디지털 정보와 물리적 실체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탐구한다.
내가 나와에서 특히 좋아하는 점은 그가 일본 미술의 고정관념에 단호히 순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많은 일본 예술가들이 만화-애니메이션 분야를 지나치게 활용하는 반면, 나와는 더 세련된 다른 길을 선택했다. 그는 현대 일본 예술과 문화를 더 미묘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새로운 세대의 일본 예술가 중 하나다. 그의 말처럼: “어쩌면 예전에는 예술가들이 작업에서 일본의 고정관념 덕을 보았을지도 모르지만, 내 세대는 더 이상 일본을 동일시하거나 그것을 대표하려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Scum” 시리즈에서 나와는 폴리우레탄 폼 조각을 통해 통제되지 않는 유기적 성장의 개념을 탐구한다. 이것은 큰 부피로 번성한다. 이 작품들은 마치 세포 분열이 격렬하게 일어나는 듯한 섬뜩한 기시감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건축가 렘 쿨하스가 언급한 “제네릭 시티(generic city)”, 계획 없는 도시화가 마치 거품처럼 지구 표면을 덮는 현상[6], 을 떠올리게 한다. 나와는 도시적, 세포적, 정보적 통제 불가능한 성장에 대한 현대적 불안을 시각화한다.
2018년 파리 루브르 피라미드 아래에서 전시된 나와의 작품 “Throne”은 금색의 높이 들린 빈 왕좌를 유기적 형태로 둘러싼 조각이다. 이 작품은 건축과 조각의 완벽한 융합을 보여준다. 작가는 이 작품이 인공지능 시대에 인류의 미래를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술에서 태어난 이 새로운 지능은 어떻게 성장할 것이며, 미래의 왕좌에 누가 앉게 될 것인가?” 이 거대한 조각은 기술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생활 공간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현대 건축적 우려를 반영한다.
나와의 몰입형 설치작품인 “Foam”은 관객이 완전히 둘러싸인 환경을 창조합니다. 건축가 피터 줌터는 건축에서의 “분위기”를 우리가 지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공간적 특성이라고 말합니다[7]. 나와는 바로 이러한 종류의 분위기, 즉 우리의 정신이 합리화하기 전에 본능적으로 영향을 받는 공간을 만듭니다.
나와를 진정으로 구분 짓는 것은 그가 범주를 초월한다는 점입니다. 그는 조각가인가, 건축가인가, 화가인가, 아니면 퍼포머인가? 이러한 모든 꼬리표는 부족하게 보입니다. 벨기에 안무가 다미앵 잘레와의 퍼포먼스 작품 “VESSEL”에 대한 그의 협업은 이러한 창의적 유동성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건축가 베르나르 추미가 쓴 바와 같이, “건축에는 사건, 프로그램, 폭력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8]. 나와는 이러한 철학을 자신의 예술에 적용하여, 동시에 오브제이자 사건이며 구조이자 퍼포먼스인 작품을 만듭니다.
중력에 의해 기울어진 캔버스 위로 물감이 흘러내리는 “Direction” 작업은 우주적 질서의 느낌을 불러일으키며, 마치 예술가가 우리 우주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힘을 가시화하는 방법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이 화폭들은 건축가 레버어스 우즈의 유체 흐름 드로잉을 떠올리게 합니다[9]. 두 예술가는 유동성과 중력을 사용하여 우리의 전통적 공간 이해를 도전하는 형태를 탐구합니다. 우즈는 자연적 및 사회적 힘에 반응하는 건축을 표현하려 했으며, 나와도 물리학의 근본 법칙에 반응하는 조각으로 같은 작업을 합니다.
나와의 작업은 물질성과 지각 탐구에 깊게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는 현대 건축의 핵심 관심사입니다. 건축가 유하니 팔라스마가 강조했듯이, “의미 있는 건축은 우리를 순수한 가능성의 세계에서 살게 한다”[10]. 나와의 작품은 바로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 우리로 하여금 공간, 물질, 지각과의 관계를 재고하도록 초대합니다.
2009년 교토의 오래된 샌드위치 공장에 설립된 그의 스튜디오 SANDWICH는 건축가, 디자이너, 예술가들이 협력하는 창조적 플랫폼으로서 기능합니다. 이러한 협업적 접근은 베를린에 있는 올라퍼 엘리아슨의 실험적 건축 작업실과 닮았습니다. 두 창작자는 분야 간 경계가 임의적이며 창의성이 중간 공간에서 번성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육체와 디지털, 현실과 가상 간의 관계를 끊임없이 탐구하는 나와의 작업은 디지털 시대 건축의 현대적 관심사와 공명합니다. 그렉 린이나 자하 하디드 같은 건축가들이 중력과 전통적 구조 이해를 초월하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 디지털 도구를 사용한 것처럼, 나와도 마치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조각품을 만듭니다.
나와의 작품이 매우 강력한 이유는 그가 우리의 지각적 확신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현실과 시뮬레이션의 경계가 점점 더 모호해지는 가상 현실과 증강 현실의 세계에서 그의 작업은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메를로-퐁티가 지각은 항상 수동적 정보 수용이 아닌 능동적 과정이라고 가르쳤듯이, 나와는 우리가 세계를 경험하는 인터페이스에 의해 우리의 세계 이해가 형성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와 고헤이의 “픽스셀” 사슴을 보고 자신의 인식 행위를 의심하지 않는다면 도전해 보세요. 익숙한 물체가 낯설게 변하면서 우리의 인지 장치의 한계와 현실의 구성된 본질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건축가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세상을 다르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현실과 가상 사이의 경계가 흐려진 이미지로 가득 찬 시각 문화 속에서, 나와는 우리에게 필요한 교정안을 제공합니다. 그의 작품은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 현실 인식 구성에 능동적인 역할을 인정하게 하는 경험입니다. 메를로-퐁티가 “지각 경험은 신체적 경험이다”[11]라고 쓴 것처럼, 나와는 우리의 시각뿐 아니라 모든 감각을 자극하는 조각품을 통해 이 기본 진리를 상기시킵니다.
메를로-퐁티의 “고유 신체” 개념은 세계를 경험하는 우리의 기본 수단으로서, 나와가 물질적 개입을 통해 우리의 지각을 조작하는 방식과 공명합니다. 그가 어떤 물체를 유리구슬로 덮을 때, 단순히 외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물체와의 지각적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나와의 예술은 메를로-퐁티가 말한 “현상학적 태도”를 채택할 것을 초대합니다. 이는 지적 분석보다는 직접적인 경험에 마음을 열라는 뜻입니다. 그의 조각품은 해결해야 할 퍼즐이 아니라 체험할 경험이며, 우리의 인식이 육체적임을 인식하도록 초대합니다. 메를로-퐁티가 “현상학적 세계는 선행하는 실체의 명시가 아니라 실재의 토대이다”[12]라고 쓴 것처럼.
고헤이 나와를 특별한 예술가로 만드는 것은 깊은 철학적 관심과 완벽한 기술적 실행을 융합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작품은 지적으로 자극적이며 시각적으로 매혹적이고, 개념적으로 엄격하면서도 감각적으로 매력적입니다. 우리를 본능적으로 감동시키고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위대한 건축가들처럼, 나와는 감정적이고 지적으로 우리를 사로잡는 대상들을 창조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나와의 작품 앞에 섰을 때, 단순히 수동적으로 관찰하지 마십시오. 현상학적으로 그와 교감하며, 지각 행위에서 당신의 능동적 역할을 인정하십시오. 왜냐하면 나와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그의 작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를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나와가 현대 미술에 기여한 가장 큰 점일 것입니다. 미술이 단순히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각을 다르게 하는 방식임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미지가 폭격하는 세상에서, 인식이 점점 화면을 통해 매개되는 세상에서, 이 상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메를로-퐁티가 가르쳤고 나와가 보여주듯, 인식은 결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창조적 행위이며, 주체와 객체, 보는 자와 보이는 자 사이의 춤입니다.
- Merleau-Ponty, Maurice. “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 Gallimard, 1945.
- 동일 서지.
- 동일 서지.
- Dal Co, Francesco. “Tadao Ando: Complete Works”, Phaidon Press, 1995.
- Frampton, Kenneth. “Studies in Tectonic Culture”, MIT Press, 1995.
- Koolhaas, Rem. “Generic City”, in “S,M,L,XL”, The Monacelli Press, 1995.
- Zumthor, Peter. “Atmosphères”, Birkhäuser, 2006.
- Tschumi, Bernard. “Architecture and Disjunction”, MIT Press, 1996.
- Woods, Lebbeus. “Radical Reconstruction”,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7.
- Pallasmaa, Juhani. “The Eyes of the Skin: Architecture and the Senses”, Wiley, 2005.
- Merleau-Ponty, Maurice. “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 Gallimard, 1945.
- 동일 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