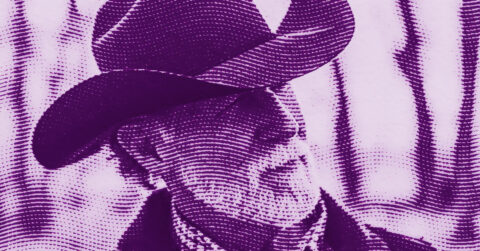잘 들어봐요, 스놉 여러분 : 저질 샴페인을 홀짝이며 전시 개막전에 출몰하는 여러분, 의미하는 바에 맞서지 않고 사인만 수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안락한 범주를 거부하는 예술가를 만날 준비를 하세요. 1965년 다카르 출생, 브뤼셀 거주인 펠라지 그바귀디는 자신의 작품의 미학에 대한 여러분의 침 뱉는 칭찬 따위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1995년 리에주 생뤽 미술학교에서 교육받은 이 베냉 여인은 현대 그리오라고 자신을 정의하며, 이는 여러분 서구 관객들이 집단 망각 속에 안락하게 자리 잡은 자신의 위치를 반성하게 해야 할 용어입니다.
그녀의 작품은 장식적이지 않고 내면적입니다. 그녀의 회화, 드로잉, 설치 작품은 즐겁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현대성의 기초 폭력을 덮어놓은 망각의 장막을 찢어내려는 것입니다. 2017년 도큐멘타 14에서 그녀가 선보인 기념비적 설치 The Missing Link: Dicolonisation Education by Mrs Smiling Stone에서 그녀는 단순히 공간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맴돕니다. 학생용 책상들, 천장에 매달린 종이 두루마리, 기록 사진, 종이 위의 흙과 립스틱, 이것이 그바귀디가 그녀의 기억 서사시를 구축하는 재료들입니다. 이 설치는 노예제, 나치즘,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한 지식 전달 방식을 정면으로 묻고,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무엇을 가르치고 기억해야 하며 무엇을 잊어도 되는지 결정하는가?
그바귀디와 특히 마르티니크 철학자 말콤 페르디난드가 전개한 탈식민 사상 사이의 관련성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입니다. 2019년에 출간된 그의 저서 Une écologie décoloniale에서 페르디난드는 현대성의 “이중 균열”을 이론화했습니다: 한쪽은 기술 관료적이고 자본주의 문명이 초래한 환경 균열, 다른 한쪽은 서구 식민화와 제국주의가 조성한 식민 균열[1]. 그바귀디는 페르디난드가 철학적으로 개념화한 이 이중 균열을 예술적으로 구현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녀가 “나는 자연을 물리적이고 유기적인 기록 보관소로 간주하며 부수적 연구 방향을 발전시켰다”고 밝힐 때[2], 이는 생태 위기가 식민 역사와 분리될 수 없다는 페르디난드의 우려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그 예술가는 이렇게 더 나아가 말한다: “스테르크폰테인(Strekfontein) 선사 시대 유적지의 발견은 나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으며, 말콤 페르디난드(Malcom Ferdinand)의 작업을 참조하며 식민주의 생태학의 맥락에서 오늘날 더욱 강하게 울려 퍼진다. 자연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비극과 위기의 증인이다” [2]. 그바귀디(Gbaguidi)와 페르디난드(Ferdinand) 사이의 이러한 지적 수렴은 공통된 이해를 드러낸다: 인종차별 반대, 페미니즘, 권리와 자유를 위한 투쟁은 모두 식민지 유산과 제국주의의 폭력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세계적인 경제적, 정체성, 생태학적 위기의 현재적 표지자이기에 공통의 토대를 찾아야 한다. 그바귀디는 이러한 생각을 단순히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녀 자신의 몸 자체를 저항과 치유의 장소로 만드는 예술적 실천 속에서 구현한다.
온-트레이드-오프(On-trade-Off)라는 예술가 집단과 함께 Z33 하셀트에서 창작한 그녀의 프로젝트 Hunger에서, 그바귀디는 세계 기아 문제를 제기하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왜 우리는 빈곤의 원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가? 이 질문은 페르디난드의 사상과 직접적으로 공명한다. 그는 식민주의 생태학 개념에서 빈곤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원인을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바귀디와 페르디난드 모두 탈식민성 제거와 지구상의 삶의 조건 개선에 기여하는 지식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녀는 투쟁을 분리하지 않으며 천연 자원 약탈, 인종화된 몸에 대한 폭력, 생태 파괴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바귀디의 작품은 페르디난드가 “식민적 거주”라 부르는 땅의 특별한 거주 방식을 구현한다. 이는 인간이든 비인간이든 타자를 행성의 공거자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다. 그녀의 드로잉과 회화는 종이나 캔버스 표면을 뚫는 구멍과 천공을 갖고 있는데, 이는 다른 현실에 대한 개방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예술가에게 그것들은 무엇보다도 돌봄의 행위이다. 이 천공들은 상처가 아니라 호흡 행위이며, 질식된 역사에서 공기가 흐를 수 있게 하려는 시도이다. 그녀는 공식 기록, 즉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록을 천공하여 피지배자의 목소리가 드러나게 한다.
현대 그리오(griot)로서 자신을 정의하는 이 예술가는 전통 유산에서 구전의 차원을 그녀만의 조형적 접근을 통해 재정의한다. 그녀는 단순히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 동작으로 그것들을 다시 불러낸다. 색연필, 밀랍, 파스텔 크레용으로 그린 그녀의 드로잉은 치유의 의식이자 트라우마를 벗어나는 축하가 된다. 그녀가 설명하듯이: “식민 기록과 관련된 독성 물질은 시를 통해 노래되고, 그려지고, 수행적 행위로 의식화되는 운율로 처리된다. 각 드로잉은 트라우마를 벗어나는 축하이며, 우리 시대의 심리적 공포에 대한 작은 승리이다” [2].
그바귀디가 현대 탈식민 철학과 대화하면서도 동시에 식민지 역사와 직접적이고 타협 없는 대결에 뿌리를 두고 있다. 2004년에 시작된 그녀의 Code Noir 작업은 이 비판적 고고학의 가장 인상적인 사례 중 하나다. Code Noir는 루이 14세가 1685년에 공포한 프랑스 왕실 칙령으로, 프랑스 식민지에서 노예제를 법제화하고 노예로 전락한 사람들의 법적 “동산 재산” 지위를 규정했다. 노예의 삶, 죽음, 처벌, 출산을 규제하는 이 법적 문서는 서양 역사에서 가장 추악한 기념비 중 하나다. 그바귀디는 역사학자들이 갖는 학문적 거리감을 가지고 이 문서를 다루지 않고, 그것을 통과하고 찢으며 다시 쓴다.
그녀의 Le Code Noir 시리즈는 특히 2006년 다카르 비엔날레에서 소개되었으며, 일곱 점의 캔버스로 구성되어 이 입법적 텍스트의 폭력을 추출해 그 공포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예술가는 Code Noir를 재현하지 않고, 그것이 생성하고 세대를 넘어 지속되는 눈에 보이는 및 보이지 않는 트라우마와 집단 신경증을 끄집어낸다. 이 기억 작업은 과들루프의 Mémorial ACTe가 100점의 드로잉을 소장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는 이 작품이 예술적이고 교육적 가치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3]. 그바귀디는 식민지 기록을 노예제도와 인종 이데올로기 형성을 이해하는 교육적 도구로 전환한다.
그바귀디가 식민지 기록에 접근하는 태도는 기존 박물관식 접근법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녀는 단순히 역사적 문서를 수동적으로 열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면하고 질문하며 위기를 조성한다. 그녀가 벨기에 테르뷔렌에 있는 중앙 아프리카 왕립박물관의 기록을 조사한 Naked Writings 작업에서 그 바귀디는 스스로 “시선의 탈화석화”라 부르는 행위를 수행한다. 제목은 선행 믿음에서 벗어나고, 따라서 마음을 탈식민화하는 탈학습의 중요성을 가리킨다. 기록들은 그녀에게 과거의 비활성 물체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현재를 구조화하는 살아있는 무기이다.
2018년, 그녀가 De-Fossilization of the Look 시리즈를 제작할 때,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1457년 이후)의 Madonna del Parto와 대화하면서 단순한 미술사 비교가 아니다. 그녀는 일련의 자동 드로잉과 회화를 통해 르네상스의 이 이미지를 탐색하며 신성시된 모성의 표현과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와 행위능력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가운의 단추가 풀린 채 속옷이 드러나 있고, 얼굴과 자세에서 피로가 묻어나는 이 임신한 마돈나는 그바귀디에게 여성성, 모성 및 신체에 대한 공식 서사를 문제제기하는 출발점이 된다.
예술가는 어안렌즈 시점을 통해 르네상스의 선형 원근법 전통을 전복한다: 동시에 모든 것을 포착하고 그녀의 주제를 감싸며 섬유처럼 해체한다, 마치 내부에서 보는 듯이. 그녀는 “나는 원근법 없이 그린다: 내 원근법은 아이, 새, 곤충, 물고기의 시점이다”라고 말한다[3]. 이 선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다. 선형 원근법, 즉 독점적이고 중심적이며 주권적인 시점을 강요하는 서양 르네상스의 기술적 성취를 거부함으로써 그바귀디는 세상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합법적 방식은 하나뿐이라는 식민지 인식론 또한 거부한다.
그녀가 2019년 루붐바시 비엔날레를 위해 만든 설치 작품 에코 뮤지엄, 아카이브 그리고 우지 킹게는 “광석 채굴장에서의 퍼포먼스에 관한 비디오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영향을 받은 심리적 공간을 드러내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묘사되며, 이러한 작업 방식을 구현한다. 가브아디는 콩고 민주 공화국의 광산에서 일하는 몸들을 촬영하는데, 이 몸들은 우리의 “녹색” 기술에 필요한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 착취되고 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콩고 민주 공화국의 광산에서는 여성, 어린이, 남성들이 불법적으로 광물을 채취하며, 맨손으로 태양 아래 아무런 보호 없이 덩어리 돌을 자갈로 부수고 있다. 그들은 생계를 위해 판매할 양동이를 채운다. 양동이 하나를 채우는 데 세 시간 일하면 20센트를 번다” [2].
가브아디에게 이 현대적 경제 폭력은 세계화된 자본주의의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식민지 채굴주의의 직접적인 연장선이다. 역사는 죽지 않았고 새로운 형태로 계속되고 있다. 그녀는 우리의 “친환경” 행위가 이러한 가혹한 현실에서 분리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기술-해결주의 담론을 거부한다. 오히려 그녀는 우리가 이 지구 어디에 살든 우리의 행동이 관계 경제, 즉 정신적 안녕의 윤리적 도덕성 구축과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가브아디는 오염, 격리, 분리 정책 사이의 교차점에 대해 특별한 성찰을 발전시켰다. 그녀는 자크 데리다의 주권에 관한 조사를 상기시켰다고 말하지만, “나는 주권을 추구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연과의 대화, 돌봄, 대지의 치유를 요구한 것이었다”[2]라고 명확히 한다. 이 미묘한 차이가 매우 중요하다. 가브아디는 지배의 틀을 재생산하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주권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삶과 돌봄의 관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그녀의 드로잉 선들은 본질로 돌아가게 했으며 집단성의 의미를 활성화시켰다.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더 많은 공간을 허용하고 그것을 드러내어 일상생활과 대화의 기본적인 동작을 통해 다시 태어나도록 했다.
돌봄에 대한 이 주의는 그녀의 최근 작업 전반에 흐른다. 그녀가 명확히 “돌봄 행위”라고 설명하는 드로잉과 회화의 구멍들은 답답한 이야기에서 숨쉬기처럼 기능한다. 그녀의 작품 체인 휴먼(2022)은 파스텔, 모직, 색연필로 종이에 그려진 일련의 드로잉으로, 서로 얽히고 연결된 몸들이 사슬을 이루며 노예제의 연결고리와 저항의 연대를 동시에 떠올리게 한다. 이 몸들은 개별화되지 않고 집단적이며, 해방이야말로 공동의 과업임을 상기시킨다.
2022년 제노 X 갤러리에서 열린 날이 밝다 전시에서 가브아디는 현대 정치적 긴박함과 직접 맞닿아 있는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어떻게 타인을 지배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가? 사회가 왜 인적 자본이 필요한가? 자본주의 세계에서 대상과 주체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수사적이지 않고, 전시된 작품들 속에 구체화되어, 집단적 신경증과 관련된 고통과 지속적이며 잠재적인 폭력을 표현한다. 아크릴과 안료로 캔버스에 그려진 날이 밝다: 의식 & 그린과 날이 밝다: 돌연변이(2021)은 변형 과정에 놓인 인간 형상을 보여주는데, 이는 탈인간화이자 급진적 신체 재발명의 과정일 수 있다.
그바귀디는 벤인의 탈식민지 이전 문화에 내재된 애니미즘적 인식과 모계적 세계관과의 연결을 소중히 여긴다. 그녀는 유산으로 물려받은 조상들의 인상과 현대적인 인상을 지닌 정신을 전한다. 이 전승은 향수를 품은 것이 아니라 확연히 미래를 향한 것이다. 예술가는 이상화된 과거를 되살리려 하지 않고, 식민주의가 지워버리려 했던 인식론과 우주론에서 영감을 얻어 현재를 살아가는 다른 방식을 구축하고 미래를 바라본다. 그녀의 예술 실천은 이 점에서 매우 정치적이며, 다른 사상가들로부터 빌릴 수 있는 표현으로서 감각의 급진적인 재분배, 다시 말해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재고를 제안한다.
그바귀디 작품의 힘은 여러 시간성을 함께 유지하는 능력에 있다. 사라지지 않는 식민지 시대의 과거, 지배 구조가 지속되는 현재, 그리고 다르게 구축되어야 할 미래이다. 매달린 종이 두루마리, 수 미터 길이로 펼쳐진 그녀의 드로잉들은 이 확장된 시간성을 물질화한다. 작품은 결코 닫혀 있지 않고 펼쳐지고, 계속되고, 강하게 주장한다. 한 선, 한 그림으로 반복되는 드로잉의 동작은 망각에 대한 저항의 형태, 부인된 것을 존재하게 하려는 완고한 주장이다.
자, 여기까지 온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펠라지 그바귀디는 평온하게 컬렉션에 넣어 변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예술가가 아니다. 그녀의 작업은 여러분에게 책임을 요구한다. 즉 그녀가 드러내는 지배 체계에서 여러분 자신의 위치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작품들을 단지 “미학적으로” 감상하는 데 그칠 수 없으며, 그들이 우리 세계에 대해 말하는 것에 마주해야 한다. 그녀가 창조하는 아름다움은 위로가 아니라 불안정함이다. 현대의 불안을 가라앉히려 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하고, 생산적으로 만든다. 이것이 이 예술가의 아름다운 역설인데, 우리 집단적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공포를 마주하게 함으로써, 다른 함께 존재하는 방식을 열어준다. 그녀의 천공은 숨결이며, 그녀의 사슬은 연대이고, 그녀의 죽은 기록은 생명이 된다.
그바귀디의 작품은 예술이 사치가 아니라 생명 유지에 필수적임을 상기시킨다. 공식 담론이 구조적 폭력을 지속해서 축소하거나 완곡하게 하거나 잊으려 할 때, 예술가는 기억의 상처를 활짝 열어 둔다. 이는 마조히즘 때문이 아니라, 오직 살아 있는 기억만이 진정한 치유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녀가 날카로운 명료함으로 표현하듯 “내 작업은 말과 이미지를 해독되고 전달되어야 할 기호로 보는 생각을 중심으로 돌아간다”[2]. 해독하고 전달하는 것, 이것이 그녀의 실천을 움직이는 이중 움직임이다. 식민성이 우리의 몸, 영토, 상상력에 새긴 기호를 해독하고, 최종적인 진리가 아닌 탐구 방법, 깨어있고 전형적인 이야기로 잠들지 않는 방식을 전달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도 조심스럽게 키워 온 집단적 기억상실증에 맞서, 그바기디는 능동적이고, 비판적이며, 행위적인 기억을 제시한다. 그녀의 작업은 과거를 기록하는 역사가의 일이 아니라 죽은 자들을 불러내어 현재를 괴롭히고 우리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하는 여성 이야기꾼의 역할이다. 이 가차 없는 역사적 공포와의 대면 속에는 역설적으로 일종의 희망이 있다.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는 순진한 희망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똑바로 바라보기를 받아들인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또 다른 방식이 가능하다는 완고한 희망이다. 펠라지 그바기디의 작품은 쉽게 위로를 제공하지 않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준다: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할 가능성, 그녀가 다른 이들과 함께 “관계의 경제(économie de la relation)”라고 부르는 것, 생태학적 투쟁과 탈식민적 투쟁이 더 이상 분리되지 않고 동일한 적과 맞서고 있음을 이해하는 세계다. 바로 이 무자비한 통찰력과 드문 강렬함을 지닌 예술적 실천이 그바기디를 현대 미술의 필수적인 인물로 만든다. 그녀가 우리를 아첨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 Malcom Ferdinand, 식민주의를 벗어난 생태학. 카리브 세계로부터 생태학을 사유하기, 파리, 르 쇠이유, 2019
- Jareh Das, “몸을 기록으로”, 펠라지 그바기디와의 인터뷰, 오큘라 매거진, 18회 이스탄불 비엔날레, 2023
- “Pélagie Gbaguidi”, Archives of Women Artists, Research and Exhibitions,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