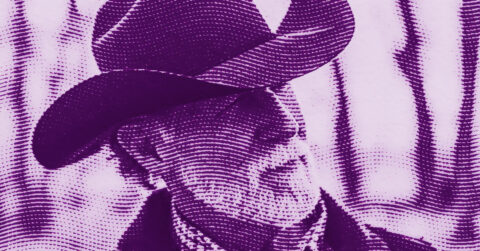잘 들어봐요, 스놉 여러분 : Celeste Rapone은 체스를 두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며, 그녀의 실수한 수들이 형태적 승리로 변합니다. 1985년 뉴저지에서 태어나 시카고에 거주하는 이 예술가는 15년 동안 몸이 구부러지고 사물이 번성하며 회화 공간이 호흡을 거부하는 포화된 구성을 통해 현대 여성 조건을 질문하는 작품을 만들어왔습니다.
2024년 Corbett vs. Dempsey에서의 최근 전시 “Big Chess”는 그녀의 접근법을 결정적으로 보여줍니다: “관객”과 “관람객”으로 나뉜 열한 점의 그림에서, 여성들은 연극적 장면에서 과성능을 발휘하거나 초상 크기로 축소되어 체념과 후회를 드러냅니다. 이 이분법은 Rapone에게 새롭지 않지만 여기서 특별한 예리함에 도달합니다. 인물들은 공원에서 거대한 체스를 두며, 하이킹하고 카누에서 상어 낚시를 합니다. 이것들은 예술가가 공간을 압축하고 해부학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인해 존재론적 시련으로 변한 평범한 활동입니다.
Rapone의 작품 전반에 걸쳐 네덜란드 황금시대에 대한 언급은 생산적 집착처럼 흐릅니다. 예술가 자신은 17세기 네덜란드 회화의 “이 단순한 출발 아이디어”에 대한 관심을 밝힙니다 [1]. 그러나 베르메르가 그의 가정 내부를 명상적인 빛으로 감쌌던 것과 달리, Rapone은 그녀의 구성에 현대 사물의 풍부함을 쏟아내어 위안보다는 불안을 자아냅니다. Nightshade (2022)에서 한 여성은 손가락으로 형성한 틀을 통해 장면을 살펴봅니다. 이 중첩은 17세기 네덜란드 화가들이 사용한 시각적 장치들을 연상시키는데, 베르메르의 외부 장면을 담는 창문, 반 아이크의 숨겨진 공간을 드러내는 거울과 유사하나 원작에는 없던 신랄한 아이러니를 띕니다.
플란데른 정물화는 귀중품의 통제된 축적으로 상업적 풍요와 세속적 허무를 찬양했습니다. Rapone은 이 어휘를 차용하지만 반전시킵니다: 그녀의 축적들, Ricola 포장지, 실리카 젤 봉지, Cherry 7UP 캔, Yellow Tail Shiraz 병은 더 이상 부의 상징이 아닌 강박적 소비주의와 과중한 가정 생활을 증언하는 21세기의 허무가 됩니다. 네덜란드 회화 장르를 사회학적 비판으로 변형하면서도 교훈적이지 않습니다. Rapone이 포함한 특정 사물들, Klean Kanteen 물병, 카라바조 복제품이 인쇄된 재킷, TikTok에서 인기 있는 David Burry “Shoe” 의자는 시간적, 문화적 표지로 작용하여 이러한 구성을 우리 현대성에 단단히 고정시키면서도 회화 전통과의 대화를 유지합니다.
빛은 또 다른 네덜란드 유산과의 접점이지만, 근본적으로 재해석된 것이다. 베르메르가 명상을 유도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자연광을 연출한 반면, 라포네는 인공적이고 극적인 조명 연출을 만든다. 그녀의 야간 내부 풍경들은, 예를 들어 “Blue Basement”(2023)에서는 세 인물이 의자-신발 위에 앉아 포커를 치는 가운데 지하실에 물이 차오르며, 억압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점점 차오르는 물은 불안한 서사적 세부로, 네덜란드 화가들이 자신의 불안정한 지리적 상황에 대해 가졌던 관심을 떠올리게 하지만, 여기서는 무시된 가정 파국의 은유로 변형된다.
공간성은 아마도 라포네와 그녀의 네덜란드 전임자들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일 것이다. 피터 데 후흐의 내부 공간들은 안정적인 기하학에 따라 원근감과 깊이를 구성했다. 반면 라포네는 깊이를 체계적으로 압축하여 인물과 사물들을 전경으로 밀어내, 불편함과 폐소공포증을 유발하는 압축감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평면성은 17세기보다는 입체파와 모더니즘에서 더 많이 유래한 것으로, 가정 장면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꾼다: 우리는 더 이상 조화로운 공간을 감상하지 않고, 프레임을 넘칠 듯한 요소들의 아찔한 축적에 직면한다.
역사적 참조를 넘어, 라포네의 작품은 우리 시대의 모순된 요구 속에 놓인 현대 여성의 몸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를 이룬다. 그녀의 인물들은 해부학적으로 불가능한 자세를 취하며, 팔다리는 늘어나고, 몸은 압축되고, 관절은 믿기 힘들 정도로 비틀려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변형은 무작위적이거나 형식적인 것만이 아니라, 여성들이 동시에 모든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받는 압박감을 시각적으로 구현한다: 야심 찬 전문가, 매력적인 파트너, 잠재적 어머니, 그리고 성취한 예술가로서.
“Muscle for Hire”(2022)는 이 주제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벨벳 소재 분홍색 운동복을 입은 여성이 축구장 한가운데에 무(無)로 빠져드는 검은 구멍을 파고 있으며, 그녀의 더러운 뒤꿈치에는 비둘기 한 마리가 앉아 있다. 그녀 주위에는 교외 출산과 관련된 쓰레기들이 쌓여 있는데, 주차권, 물병, 리콜라 사탕, 실리카겔 봉지가 있다. 이 작품은 라포네가 40대에 접어들며 자신의 출산과의 관계를 탐구하던 시기에 그려졌다. 이러한 자전적 차원은 그녀의 전 작품을 관통하지만 직접적인 고백으로 흐르지는 않는다. 인물들은 충분히 일반적이어서 교육받고 야망 있는 한 세대 여성 전체의 조건을 대변하는 아바타로 기능한다.
“House Sounds”(2023) 시리즈는 현대 여성 일상의 사회학을 확장한다. “Drawing Corner”에서는 한 여성이 저항 밴드를 이용해 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바로크 정물화를 그리고자 한다: 빛나는 해골, 보라색 아스파라거스, 뱀 가죽 부츠, 그리고 다림판 위에 놓인 파르메산 치즈. 이러한 다중 작업 시도는 여성들에게 모든 것을 동시에 해내야 한다는 요구를 보여주며, 심지어 가정 공간조차도 영구적 공연 무대로 전환된다. 바닥에는 빈 공식 봉투가 떨어져 있어, 아마도 이 창조적 광란을 부추기는 경제적 긴급성을 암시한다.
라포네에게 유머는 이러한 압박에 맞서는 저항 전략입니다. “Trymaker” (2023)는 철망 울타리 뒤에 접힌 채 있는 의자에 앉아 분홍색 버킷햇과 낡은 흰 속옷을 입은 여성을 보여주며, 작은 정원을 로봇 잔디깎이가 돌보고 있습니다. 관객 쪽으로 날아가는 듯한 공놀이 장면은 탈출에 대한 열망과 자유의 불가능성을 모두 형상화합니다: 끈에 묶여 있어 결국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방으로 제시된 가정 내 감금의 이 이미지는 작품이 담은 사회학적 비판을 요약합니다.
라포네가 세심하게 구성에 포함한 특정 물건들은 민족지학적 데이터처럼 작용합니다. 목걸이, 문신, 샤넬 스티커, 토트백, 브라질리언 왁싱, 레이스 브래지어: 이 요소들은 특정 계층과 세대의 신체적·소비적 실천을 기록합니다. 뉴저지의 이탈리아계 미국인 가톨릭 가정 출신인 라포네는 자신의 과거에서 시각적 어휘를 만들어내며 단순한 개인적 일화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십대 시절에 원했지만 부모님이 사주지 않았던 운동화, 고등학교 파티에서 빛나게 하려고 사던 빛나는 목걸이, 이러한 세부사항들은 킷치에 갇힌 채로도 격조를 갈망하는 중산층 문화의 증상입니다.
세대적 차원은 “Nightshade” (2022) 전시에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침울한 색조,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복제품이 부착된 전화기로 뉴저지 트랜싯에서 찍은 셀피, 새벽 3시 14분에 면도칼로 썬 마늘: 이런 장면들은 지나간 청춘에 대한 양가적 향수와 불만족스러운 현재에 대한 불안을 불러일으킵니다. 라포네는 자신의 예술 경력이 실패했을 경우, 고향 교외에 머물면서 가끔 뉴욕의 미술관을 참관하였지만 결국 도달한 전문적 성취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명확히 탐구합니다.
이 사회학적 탐구는 회화 실천 자체를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 라포네는 준비 스케치 없이 즉흥적으로 일층씩 쌓아 올리며 그리기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식을 체스 게임에 비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체스와 비교해 흥미로웠던 점은, 그림에서 우리는 일련의 선택을 하지만 그 선택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서로 반응할지 확신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해서 무언가가 열릴 때까지 시도합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가 패배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 후에도 계속해서 다시 또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2]. 이 진술은 그녀 작품에서 형식적·실존적 고민이 교차하는 지점을 완벽히 요약합니다: 그림에서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 은유가 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셀레스트 라포네의 작품은 회화적 유산과 현대적 긴급성, 기술적 기교와 끊임없는 의심, 유머와 절망 사이의 불편한 교차점에 위치합니다. 그녀가 온몸을 틀어넣어 아첨하는 재배치를 거부하는 결정은 미학적 행위이자 정치적 제스처입니다: 이 여성들을 그들의 취약함, 서툼, 불가능한 자세로 완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술가는 진행 중인 작품이 자신을 웃게 할 때 그림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남편에게 털어놓았다[3]. 이 고백은 그녀의 작업에서 유머가 해방적인 기능을 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모순된 명령, 만연한 불안, 압도적인 기대에 맞서 웃음은 저항 행위가 된다. 라포네의 인물들은 자세를 유지하거나, 임무를 완수하거나, 이상을 구현하는 데 극적으로 실패하지만, 바로 그 실패가 완벽성의 폭군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킨다.
이 불완전함의 축하는 여성의 조건을 아름답게 꾸미지 않고 그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폴라 레고나 니콜 아이젠만 같은 예술가들의 작업을 이어간다. 그러나 라포네는 자신의 목소리를 더하는데, 이는 교외 출신의 이탈리아계 미국인이라는 배경, 엄격한 학문적 훈련, 그리고 무엇보다 불편함을 회화적 힘으로 바꾸는 능력에 의해서다.
“Swan”(2019)에서 캔버스를 당기는 여성을 묘사할 때, 이 노동적인 제스처의 부재한 우아함을 비꼬는 제목 속에서, 라포네는 아마도 가장 드러나는 행동을 행한다: 회화를 육체적 노동, 험한 노력, 물질과 자기 자신과의 싸움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은 캔버스의 뒷면이 되어 내부 구조를 드러내고, 환상을 거부하며 건축을 과시한다. 이러한 형식적 정직성은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감정적 정직성을 반영한다.
라포네는 어떤 해결책도, 쉬운 위로도 제시하지 않는다. 그녀의 인물들은 압축된 공간에 갇혀 소유물에 짓눌리고 야망에 구부러져 있다. 하지만 오늘날 여성으로 존재하는 어려움을 신랄하게 표현하고, 전통적인 회화적 유혹을 거부하며, 당당히 쌓아 올린 당혹스러운 디테일 속에서 역설적으로 존엄이 나타난다. 이 여성들은 실패하지만 분명히 시도한다. 계속해서, 여러 각도에서 접근하며, 결국에는 무엇인가 열리기를 바란다. 예술가가 캔버스 앞에 서 있듯이.
- Art Verge, “Playful Interplay of Volumes and Colours Command Celeste Rapone’s Paintings”, Yannis Kostarias, 2019년 3월 8일
- Meer Art, “Big Chess”, 2024년 11월 25일
- Femme Art Review, “The Figure Does Not Win Every Time: In Discussion with Celeste Rapone”, Elaine Tam, 2020년 7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