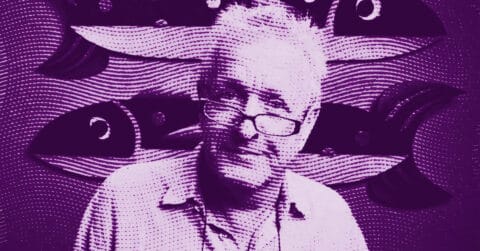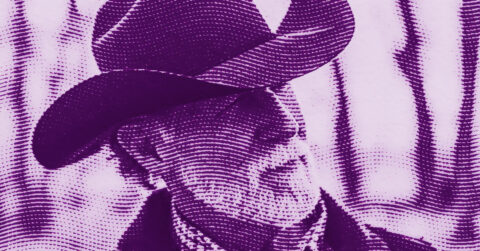잘 들어봐요, 스놉 여러분! 나는 여러분께 에디 마르티네즈에 관해 할 말이 있다. 그는 자신의 격렬한 생명력에 절대 미안해하지 않는 열정적인 그림의 주술사이다. 여러분이 하얀 갤러리에서 저급한 샴페인을 홀짝일 때, 그는 권투 선수 같은 긴박함으로 거대한 캔버스 위에 물감을 쏟아붓는다. 권투라는 스포츠를 자신의 예술적 실천과 자주 비교하는 그이다.
마르티네즈는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붓질 하나하나가 존재의 선언인 것처럼 그린다. 요즘 그의 명성은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24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Nomader”로 산마리노를 대표하고, 서울의 Space K와 뉴욕의 Parrish Art Museum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그러나 그의 그림이 순해지거나 길들여졌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니다, 여전히 야생적이고, 거칠며, 내장부터 우러나오는 감정이 살아 있다.
그의 “White Outs”를 보세요, 여기서 그는 실크스크린된 실루엣 위에 부분적으로 흰색을 덧칠하여 사라졌다 나타나는 형태들의 유령 같은 안무를 만듭니다. 이 기법은 말라르메의 시와 페이지 공간을 활용한 그의 놀이를 기묘하게 상기시킵니다[1]. 상징주의 시인이 단어들 사이에 시각적 침묵을 만들기 위해 흰 공간을 사용한 것처럼, 마르티네즈는 흰색을 활성 긴장의 공간으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색상이 아니라 혼돈을 조직하고 그의 광란의 구성에서 숨을 쉴 공간을 만드는 구조적 요소입니다.
마르티네즈의 작품은 현대 시의 역사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흔적을 부분적으로 지우고, 하얀 페인트 층 아래에 반쯤 보이는 형태를 떠오르게 할 때, 그는 “부족의 말에 더 순수한 의미를 부여하는” 말라르메적 제스처[2]를 다시 수행합니다. 그는 자신의 시각적 어휘를 정화하지만 결코 완전한 삭제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유령들은 지속되고 흔적들은 남아 있습니다.
이 말라르메와의 대화는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시인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내는 효과를 그려라”라고 썼습니다[3]. 마르티네즈가 작은 샤피 영구 마커 그림을 거대한 회화로 변형시킬 때, 이것은 정확히 그가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림을 충실히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에너지, 자발성, 즉시성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그의 정신에 미치는 효과를 그립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르티네즈는 특별한 지식인이나 고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의 창작 과정을 로저 페더러의 작업과 비교하는 집착적인 테니스 매니아입니다. 페더러가 코트 위에서 보여주는 우아함 뒤에 있는 끈질긴 노력을 말입니다. 그는 “나는 그림이 턱에 강한 한 방과 같기를 원한다, 갑작스럽고 에너지 넘치며 완전히 즐겁지 않은” 듯 말할지도 모르며, 이는 엘레인 드 쿠닝이 스튜어트 데이비스에 대해 관찰한 것을 재구성한 말입니다[4].
말라르메의 시가 그의 작품에 구조적 차원을 불어넣는다면, 독일 표현주의 영화는 심리적 차원을 드러냅니다. “Dr. Caligari의 캐비닛”(1920)의 왜곡된 그림자들은, 고의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생성하기 위해 건축 공간이 왜곡된[6] 것처럼, 마르티네즈가 그의 그림에서 끌어내는 고통스러운 실루엣과 현대적으로 공명을 이룹니다[5]. 특히 “Primary”(2020)에서 그는 순수한 흰 배경 위에 원색의 기본 형태들을 병치합니다. 두꺼운 검은 윤곽선은 붉은색, 파란색, 노란색 영역을 구분하며 무정형 공간 안에 떠 있는 듯합니다. 그의 “White Outs”에서 흑과 백을 사용하는 방식은, 극심한 대비가 존재적 불안을 형성한 표현주의 사진을 직접 떠올리게 합니다. 홀스텐발의 구불구불한 거리는 마르티네즈의 구불구불한 선들과 동시대적 대응을 이룹니다.
표현주의 영화는 그림자를 무의식의 시각적 은유로 사용했습니다. 이와 같이, 마르티네즈는 그의 캔버스에 자신의 집착의 그림자를 투사하며, 두개골, 새, 그리고 그의 구성을 괴롭히는 유기적 형태들이 그것입니다. 뭉라우의 “Nosferatu”에서 뱀파이어의 그림자가 그의 물리적 존재에 앞서듯, 마르티네즈의 실루엣들은 실체와 무형 상태 사이의 영역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7].
그러나 마르티네즈는 단순히 고뇌하는 비관론자가 아닙니다. 그의 그림에는 야생의 기쁨이 있으며, 표현주의적 불안을 초월하는 창조 행위 자체를 축하합니다. 그는 “그것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전부, 그림 그리기”라고 말합니다[8].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선언은 본질을 드러냅니다: 마르티네즈는 무엇보다도 그림 그리기의 행위에서 구원을 찾는 화가입니다.
마르티네즈가 재료와 맺는 관계는 거의 에로틱하다. 그는 그것들을 쓰다듬고, 거칠게 다루며, 유혹한다. 그는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한다, 칼, 붓, 안료 막대, 페인트 스프레이 [9]. 그는 도구들을 계층화하지 않고, 한 기법을 다른 기법보다 신성시하지 않는다. 그림 전통에 대한 이러한 무례한 태도는 자주 자기 규칙에 갇혀 있는 예술계에서 신선하게 다가온다.
마르티네즈는 “나는 진짜로 속도에 관심이 있다. 그것이 나를 가장 흥분시키는 것이다, 많은 생각 없이 이루어지는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10]. 즉각성에 대한 이 가치 부여, 본능은 우리를 독일 표현주의로 데려간다. 그곳에서는 감정의 직접적 표현이 현실의 충실한 재현보다 우선시되었다. 표현주의 영화감독들은 변형된 배경과 과장된 그림자 놀이를 통해 인물의 정신 상태를 나타내려 했으며, 마르티네즈는 빠른 동작과 대담한 색 및 형태의 병치를 통해 내면 세계를 표현한다.
이 직관적인 접근법이 구조 없이 혼란스러운 그림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오해하지 마라. 마르티네즈는 각각의 흔적을 정확히 어디에 놓을지 아는 엄격한 작곡가다. 시각적 왜곡을 세심하게 계획했던 표현주의 감독들처럼, 마르티네즈는 혼돈을 정밀하게 연출한다.
“Emartllc No.5 (Recent Growth)”(2023)를 보면, 캔버스 왼쪽에 “bufly”(그의 아들이 만든 “butterfly” 즉 나비라는 단어의 변형)가 오른쪽에서 폭발적 활동을 촉발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구성은 우연이 아니다. 변형의 이야기, 잠재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는 형태의 통제된 이동이며, 말 없이도 이해되는 시각적 내러티브다.
이 그림의 역동성은 표현주의 영화 속 꿈 장면들을 떠올리게 한다. 그곳에서는 서사 논리가 감정 논리로 대체되었다 [11]. 갑작스러운 전환, 규모의 왜곡, 예상치 못한 병치, 이 모든 요소가 마르티네즈 작품에 나타나 이성에 도전하지만 잠재의식에 직접 말을 거는 시각적 경험을 만든다.
마르티네즈는 끊임없이 자신의 시각 언어를 분해하고 재구성한다. 그는 2009년 “Bad War”에서처럼 새 작품을 창조하기 위해 그림을 덮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12]. 이런 연속된 층 쌓기 접근법은 지질학적 층과 같은 역사적 깊이, 결정과 동작의 층위를 가진 회화를 만들어낸다.
비평가 데이비드 코긴스는 마르티네즈가 “맑은 탐구 정신으로 정물화를 재활성화한다… 포스트모던 자세보다는”고 썼다 [13]. 이 관찰은 본질을 찌른다: 모든 역사적 참조에도 불구하고 마르티네즈의 그림은 결코 냉소적이거나 계산적이지 않다. 그것은 깊이 진실하며, 예술의 변혁적 힘에 대한 믿음에서 거의 순수하다.
마르티네즈를 정말로 돋보이게 하는 것은 추상과 구상 사이를 강제하거나 인위적으로 보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오가는 능력이다. 그의 “blockheads”는, 작품에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이 네모난 머리들은, 상업적 편의를 위해 이용하는 모티프가 아니라 창작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형태다. 그는 “옳다고 느껴지면 하고, 거짓이라고 느껴지면 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14].
이 진정성은 현대미술 세계에서는 드문 일입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시장의 트렌드에 따라 작품을 제작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르티네즈는 자신의 본능과 내면의 리듬을 따릅니다. 그는 기반 구조를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즉흥 연주하는 재즈맨과 같습니다. 이 구조가 탐구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탐구에 관해 이야기하자면, 그의 드로잉과의 관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르티네즈는 끊임없이, 어디서나 드로잉을 합니다. 집에서도, 여행 중에도, 메모지, 냅킨, 심지어 아무 종이 위에서도 그립니다. 이 드로잉들은 단순히 그의 회화를 위한 준비물이 아니라, 독립적인 작업이자 일상의 기록을 담은 시각적 일지입니다 [15]. 이것은 빔 벤더스가 예술영화에 빗대어 “비주얼 노트북”이라고 부를 법한 것입니다 [16].
실제로 마르티네즈의 드로잉 작업은 누벨바그 영화 감독들의 접근법과 강한 유사성을 보입니다. 그들은 가벼운 카메라로 일상의 즉흥적인 순간들을 포착했습니다. 고다르가 “영화는 초당 24번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듯, 마르티네즈는 드로잉을 통해 즉각적인 진실과 덧없는 인상을 포착합니다 [17].
이러한 일지형 작업은 이후 보다 정교한 그의 회화에 영감을 줍니다. 2015년부터 그는 샤피 마커로 그린 작은 드로잉을 대형 캔버스에 실크스크린으로 인쇄한 뒤, 페인트로 확장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기법은 드로잉의 즉흥성을 유지하면서 대형 스케일의 가능성을 활용하게 해줍니다. 그는 이 시리즈를 “Love Letters”라고 부르는데, 많은 드로잉이 그와 그의 아내이자 예술가인 샘 모이어가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받은 편지지에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18].
이 일화에는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이는 마르티네즈의 예술이 일상생활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평범한 사물을 예술적 표현의 매개체로 변형시키는 방식을 드러냅니다. 그의 예술은 너무 심각하지 않으며, 거창한 허세에 싸여 있지 않고 평범함 속에서 시를 발견합니다.
이런 민주적인 성격과 접근성은 마르티네즈 작품의 큰 강점 중 하나입니다. 그의 예술은 순수한 시각적 에너지, 역사적 참조, 기량, 혹은 단순한 원초적 생명력 등 다양한 수준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예술사 박사 학위가 없어도 배제하지 않고, 또한 과소평가하지도 않습니다.
베네치아 비엔날레에 출품된 “Olive Garden”(2024)에서 마르티네즈는 우리의 기대를 교묘히 조작합니다. 제목은 고의적으로 미국 식당 체인을 떠올리게 하지만, 작품 자체는 상업화된 이탈리아 요리와는 무관한 폭발적인 색채와 형태의 향연입니다 [19]. 이는 아이러니한 윙크이자, “예술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되, 과소평가하지도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진지함과 유희, 전통과 혁신, 추상과 구상의 긴장은 마르티네즈 작업의 핵심입니다. 그는 단순한 이분법이나 쉬운 분류를 거부합니다. “나는 내가 어떤 화가인지 알고, 영향을 주는 것에 영향을 받기에, 절대로 단색 검은 사각형을 만들어서 그걸 추상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추상이다”라고 말합니다 [20].
이 독립 선언은 상쾌합니다. 마르티네즈는 특정 예술 전통에 자신을 묶어두거나 정해진 미학적 프로그램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미술사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 즉 추상 표현주의, 코브라, 신표현주의, 필립 거스턴 등을 취해 자신만의 종합체를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피상적인 절충주의로 보지는 말자. 마르티네즈의 예술은 겉보기의 일관성 없음 속에 깊은 일관성이 있다. 그 자신도 말했듯이: “나는 누구도 무언가를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고 느끼길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내 작품에서 사람들이 봤으면 하는 특별한 게 없다, 나는 모든 것이 해석되길 원한다” [21].
이런 해석에 대한 개방성은 무관심이 아니라 신뢰의 표시다. 마르티네즈는 자신의 예술의 힘을 충분히 믿기에 관객이 자신만의 길을 찾도록 내버려 둔다. 그는 위대한 시나 위대한 영화들처럼, 최종 해석에 저항하면서도 깊은 몰입을 초대하는 그림을 만든다.
마르티네즈의 작품이 매우 매력적인 이유는 그것이 여러 시간적이고 스타일적인 차원에서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현대적이면서도 시대를 초월하고, 개인적이면서도 보편적이며, 학문적이면서도 본능적이다. 그것은 향수 없이 과거에서 끌어내고, 거만하지 않게 미래를 바라본다.
그리고 그것을 전염성 있는 에너지, 창작 행위 자체에서 거의 어린아이 같은 기쁨으로 해낸다. 그가 간단히 말하듯이: “난 단지 내게 발기를 주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 [22]. 이 솔직함은 우리가 처음 예술을 사랑하게 된 이유를 상기시킨다. 그것은 예술의 상업적 가치나 문화적 권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감동시키고, 흥분시키며, 살아 있음을 느끼게 하는 능력 때문이다.
그러니, 스놉 여러분, 복잡한 설명을 찾으려 하지 말고 단순히 마르티네즈의 물결에 몸을 맡기라. 그의 붓질의 리듬과, 색깔의 맥박, 선들의 긴박함을 느껴보라. 그리고 아마도, 아주 아마도, 여러분은 그 원초적인 흥분, 즉 훌륭한 예술의 진정한 척도인 미학적 발기를 느낄 것이다.
- Mallarmé, S. (1897). 결코 우연을 없애지 못할 주사위 던지기. 갤리마르 출판사.
- Mallarmé, S. (1887). 에드가 포의 무덤. “시집” 중.
- Mallarmé가 Henri Cazalis에게 보낸 편지, 1864년 10월 30일.
- De Kooning, E. (1957). ARTnews에서 Stuart Davis에 대한 비평.
- Eisner, L. (1969). 악마의 스크린: 막스 라인하르트와 표현주의의 영향. 라므세이 출판사.
- Kracauer, S. (1947). 칼리가리부터 히틀러까지: 독일 영화의 심리사. 프린스턴 대학 출판부.
- Elsaesser, T. (2000). 바이마르 영화와 그 이후: 독일의 역사적 상상력. 라우틀리지.
- Simonini, R. (2012). “과정: 에디 마르티네즈”. 더 빌리버.
- 동일 출처.
- Pricco, E. (2019). “에디 마르티네즈: 빠른 서브”. 주캅스 매거진.
- Kaes, A. (2009). 쉘 쇼크 시네마: 바이마르 문화와 전쟁의 상처. 프린스턴 대학 출판부.
- Simonini, R. (2012). “The Process: Eddie Martinez”. The Believer.
- Coggins, D. 미첼-인스 & 내쉬 기록 보관소 인용.
- Pricco, E. (2019). “Eddie Martinez: Fast Serve”. Juxtapoz Magazine.
- Chen, P. (2023). “Eddie Martinez가 그의 그림의 욕망에 따르다”. The New York Times Style Magazine.
- Wenders, W. (1991). 영상의 논리: 에세이와 대화. 페이버 & 페이버.
- 장 루크 고다르에게 귀속된 인용문.
- Chen, P. (2023). “Eddie Martinez가 그의 그림의 욕망에 따르다”. The New York Times Style Magazine.
- Artforum (2024). “베니스 일지: 산 마리노 파빌리온에서 Eddie Martinez”.
- Tiernan, K. (2017). “Eddie Martinez: ‘나는 단지 사람들이 작품을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하길 원한다'”. 스튜디오 인터내셔널.
- Ibid.
- Simonini, R. (2012). “The Process: Eddie Martinez”. The Belie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