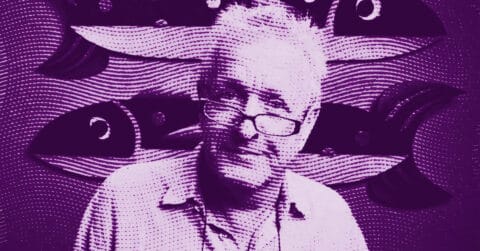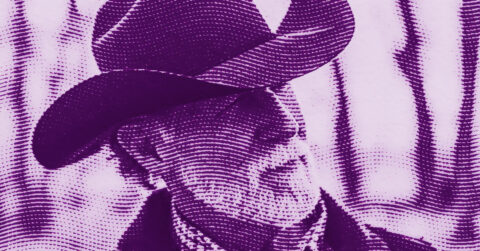잘 들어봐요, 스놉 여러분, 당신이 즉시 주목해야 할 현대 미술 현상이 있습니다. 1993년생 체코의 젊은 화가 보이테흐 코바르지크는 오래된 신화를 대담하게 해체하여 현대 세계에서 다시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그의 거대한 그림들은 단순히 그리스 신화를 재해석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대 이야기를 우리 사회에 대한 신랄한 해설로 전환하는 시각적 폭로입니다. 그의 헤라클레스 같은 인물들은 과장된 비율과 푸르스름하거나 초록빛, 누르스름한 색조로 표현되어 위엄 있으면서도 동시에 연약한 존재감을 갖고 공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것은 Art Review의 비평가가 제안한 것처럼 단순한 문화 도용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양의 규범에 대한 깊고 필수적인 전복입니다. 코바르지크는 이 인물들을 그 고전적 유럽 맥락에서 뿌리째 뽑아내어, 우리 문화적 정체성의 구성 그 자체를 질문하는 회화로 변화시킵니다.
조금 물러서서 코바르지크가 실제로 하는 일을 살펴봅시다. 그는 조각과 회화 사이의 중간 왕국에서 튀어나온 듯한 신들을 창조합니다. 도예를 전공했던 이 예술가는 그의 그림에 모래를 섞어, 돌과 대리석을 연상시키는 거친 질감을 부여합니다. 이 기법은 Aloïs Riegl이 발전시킨 촉각 이론을 떠올리게 하며, 그에 따르면 예술은 촉각적 인식과 시각적 인식 사이에서 진화합니다 [1]. 코바르지크의 작품에서 그림 표면은 이 두 인식 양식이 얽히는 영역이 되어, 우리가 화면 위의 무형 이미지에 압도되는 시대에 이미지의 물리적 힘을 되살립니다.
그의 신화적 인물들이 마치 캔버스에 갇힌 듯한, 그들의 거대함을 담기에는 액자가 너무 작다는 듯한 모습에는 기분 좋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Atlas Holds the Firmament on his Shoulders” (2023)에서는 아틀라스의 거대한 형상이 하늘의 무게에 눌린 듯 보일 뿐만 아니라 캔버스 자체의 한계에도 눌린 듯이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대적 조건에 대한 완벽한 은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문화 신화의 무게에 짓눌린 현대의 아틀라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말입니다.
코바르지크는 자신의 감수성을 통해 신화를 재해석한 예술가들의 계보에 속합니다. 네오클래식 시기의 피카소나 고통스러운 인물들을 그린 프랜시스 베이컨처럼 말이죠. 그러나 전임자들과 달리 코바르지크는 이 신성한 인물들에게 인간성을 불어넣습니다. 그의 헤라클레스는 전통적 영웅이 아니라 우울하고 내성적인 인물입니다. “Hercules Dips his Arrows in the Hydra’s Poisonous Black Blood” (2023)에서는 싸움의 영광스러운 순간이 아니라, 그 이후의 평온한 명상 순간을 보여주어 반신을 인간화합니다.
명상에 대해 말하자면, 코바르지크의 작품과 프리드리히 니체의 그리스 신화에 대한 사유 사이의 평행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비극의 탄생”에서 니체는 그리스인들이 예술을 사용하여 존재의 공포를 견딜 만한 것으로 변형시킨 과정을 탐구합니다 [2]. 이와 마찬가지로 코바르지크는 그리스 신화의 종종 폭력적인 이야기를 인간 조건에 대한 시각적 명상으로 변모시킵니다. 그의 신들은 멀리 떨어져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처럼 불완전하고 연약합니다.
이 신화 해체 접근법은 특히 여성 인물 묘사에서 두드러집니다. 그의 “아프로디테”는 보티첼리의 섬세하고 천상의 여신이 아니라 당당하고 강력한 인물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남성의 욕망 대상에 국한되기를 거부하는 여신입니다. 아직도 남성의 시선이 지배하는 예술 세계에서, 신화 속 여성 인물에 대한 이러한 재해석은 신선하면서도 필수적입니다.
코바리크의 색상 팔레트는 그의 주제만큼이나 전복적입니다. 그의 전기적인 파란색, 산성 녹색, 불타는 주황색은 꿈과 악몽 사이를 오가는 시각적 세계를 창조합니다. 이러한 비자연주의적 색채는 우리가 신화의 영역에 있음을 상기시키면서도 현대적인 생생함으로 현재에 단단히 뿌리내리게 합니다.
미술 평론가로서 나는 종종 문화적 참조 뒤에 숨기만 하고 대화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는 예술가들을 마주합니다. 코바리크는 그런 부류가 아닙니다. 그는 피카소에서 르제, 소련 조각에서 멕시코 프레스코화에 이르기까지 영향들을 진정으로 소화하여 매우 개인적이고 현대적인 무언가를 창조합니다.
그의 작업은 극우가 고대 고전을 일종의 “순수 서구 문화”의 상징으로 착취하는 우리 시대에 특히 적절합니다. 코바리크는 다양한 피부색과 양성적 특징을 가진 헤라클레스를 묘사함으로써 이러한 착취의 부조리를 보여줍니다. 그는 이러한 신화가 인류 모두의 것임을, 그것들을 문화적 벽을 세우려는 이들만의 것이 아님을 상기시킵니다.
니체는 신화가 영원한 진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진화하는 문화적 구성물임을 가르쳤습니다 [3]. 코바리크는 이 아이디어를 깊이 이해하는 듯합니다. 그의 그림들은 고대 신화의 삽화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시대에 적절하게 만드는 재창조입니다.
니체 철학은 코바리크 작품에 나타나는 아폴로적 요소와 디오니소스적 요소 간의 긴장 속에서도 보입니다. 그의 구성의 형식적 균형(아폴로적 요소)은 붓질과 색채의 거친 표현성(디오니소스적 요소)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 긴장은 관람자로 하여금 적극적인 성찰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시각적 에너지를 만듭니다.
코바리크 작품의 진정한 매력은 그가 다양한 예술 전통 사이를 자유롭게 항해한다는 점입니다. 그는 유럽 고전미술뿐 아니라 소련 선전 포스터의 미학, 디에고 리베라와 호세 클레멘테 오로스코 같은 멕시코 벽화 화가들의 표현주의에서도 영감을 얻습니다. 이러한 영향의 융합은 문화적 경계를 초월하는 시각언어를 형성합니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는 “카프카와 그의 전구자들”이라는 에세이에서 모든 예술가는 자신의 전구자를 창조한다고 제안합니다 [4]. 마찬가지로 코바리크는 이질적인 영향들을 통합하여 일관된 전체를 이루는 자기 자신의 예술적 계보를 만듭니다. 그의 “사계”(2023)라는 그림은 페르세포네를 묘사하면서 고대 프레스코화와 현대 예술을 동시에 떠올리게 하며, 예술사의 직선적 개념에 도전하는 시간의 다리를 만듭니다.
비교문학은 코바리크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흥미로운 틀을 제공합니다. 문학 연구가 텍스트가 문화적, 언어적 경계를 어떻게 넘나드는지 살피듯, 코바리크 작품은 시간적, 스타일적 경계를 넘나듭니다. 그는 호미 바바가 “제3의 공간”이라고 부를 만한 문화를 교섭하는 장소를 창조하여 새로운 의미가 탄생할 수 있게 합니다 [5].
“Leandros and Hero”(2024)에서 코바릭은 바다에 의해 떨어진 두 연인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빛나는 구슬을 들고 고개를 숙인 히어로와 그녀 위를 떠다니는 레안드로스의 구도는 재앙 직전의 긴장된 순간을 완벽하게 포착합니다. 이 그림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자, 분리와 한계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어 문화와 시대를 초월해 울려 퍼집니다.
문학 평론가 해롤드 블룸은 “영향의 불안”[6]를 언급했는데, 이는 예술가들이 선배들의 무게에 느끼는 불안감을 말합니다. 코바릭은 이 불안을 창조적 힘으로 바꾼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미술사 영향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고, 그 영향력을 포용하면서 동시에 전복시키고 있습니다.
코바릭 작업에서 가장 인상 깊은 점은 그의 진실성입니다. 종종 냉소적이고 자기참조적인 예술 세계에서, 그는 기본 인류 감정인 사랑, 두려움, 우울, 의미 탐구에 직접 호소하는 작품을 과감히 만듭니다. 그의 그림은 차가운 지적 놀이가 아니라 인간 조건에 대한 따뜻하고 박동하는 표현입니다.
보이테크 코바릭은 우리가 왜 신화가 필요한지 상기시켜 줍니다: 이상화된 과거의 고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진화하며 존재의 복잡성을 헤쳐 가도록 도와주는 살아있는 이야기로서. 그의 변화된 거인들은 우리의 현대 거울로서 우리 자신의 투쟁과 열망을 시간을 초월하는 시각 언어로 비춥니다.
그러니 누군가 구상화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말할 때, 그들을 코바릭의 작품으로 안내하세요. 이 체코 예술가가 어떻게 이 오래된 매체를 우리의 혼란스러운 시대에 맞게 재창조하는지 보여주세요. 만약 그래도 그들이 설득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다른 곳으로 가도 됩니다. 예술은 냉소주의자와 권태에 빠진 이들의 손에 맡기기엔 너무 중요합니다.
- Riegl, A. (1901). 후기 로마 미술 산업. 비엔나: 오스트리아 고고학 연구소.
- Nietzsche, F. (1872). 비극의 탄생. 라이프치히: E.W. 프리츠쉬.
- Nietzsche, F. (1886). 선악의 저편. 라이프치히: C.G. 나오만.
- Borges, J.L. (1951). “카프카와 그의 선구자들” 조사 중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에디토리알 수르.
- Bhabha, H.K. (1994). 문화의 위치. 런던: 라우틀리지.
- Bloom, H. (1973). 영향의 불안: 시 이론. 뉴욕: 옥스포드 대학교 출판부.